
<강릉 오대산 지도江陵汚臺山地圖>, 19세기, 영남대학교 박물관 소장.
오대산의 산봉우리들과 사찰 · 암자 · 대臺의 위치를 표시한 지도로 상원사를 중심에 두었다.
그림 윗쪽에 오대산의 지세와 고적에 대한 상세한 기술이 있다. 오대산의 별명이 '청랭산淸冷山'
이라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다. '청랭' 이란 말은 산의 주위 성곽과 천봉만학이 서성西城의
청랭산과 털끝만치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다고 하였다.

골골이 합류하는 지점에 상원사가 내려다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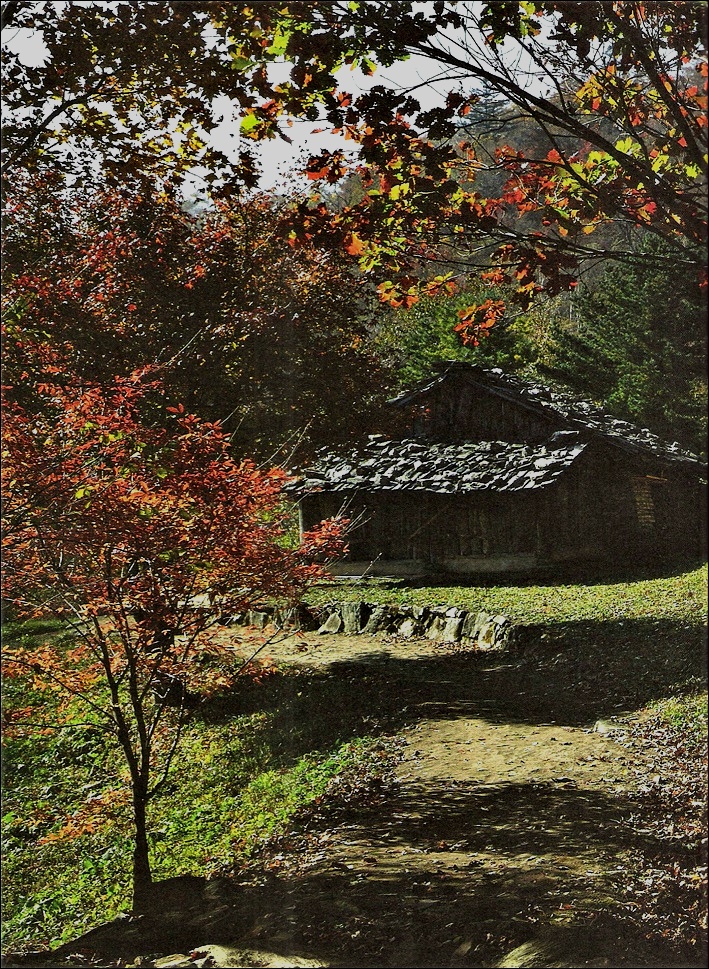
서대 염불암
김창흡金昌翕, 「오대산기五臺山記」
초8일 맑다. 순여筍與(죽여)를 갖추라고 재촉하였다. 월정사 승려는 고의로 더디게 출발하였으나,
도리어 놀이의 흥취를 깊고 길게 만들었다. 세 사람이 순여를 나란히 하고 곧장 북쪽으로 향하여,
시내를 따라 나아갔다. 처음 땅은 바위와 시내가 그윽하고도 깨끗하여 감상할 만하였다.
대략 10리를 가서 나무다리를 건너매, 양쪽 기슭이 잘린 듯 마주하여 천연으로 교지橋地를 이루었고,
맑은 여울이 그 한가운데로 쏟아져 나와 거문고와 축의 소리를 낸다. 서쪽으로 나아가서 산기슭을
넘자 작은 암자와 마주치는데, 이름을 금강대라 하며, 그윽하고 으슥해서 은둔할 만하다.
다시 수백 걸음을 나아가자 사고史庫(오대산 사고)가 있다. 수많은 산들이 부지하고 공읍하여 마치
온갖 신령이 옹호하고 보전해 주는 듯하다. 위아래 두 개의 각閣인데, 아래쪽 각은 금궤禁匱를 보관하고
위쪽 각은 선첩璿牒(왕가의 족보)을 받들고 있다. 그 둘레는 돌담을 쌓았는데, 아주 낮고 작다. 그리고
숲에서 수십 걸음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화소火巢(산불을 막기 위해 해자를 파고 나무를 불사른 곳)
를 만들어 두었는데, 역시 너무 핍근하고 좁은 듯하다.
왼쪽에는 영감사가 있다. 수승守僧과 재랑齋郞이 거처하는데, 영건營建은 고려 때 하였다고 한다. 벽에는
김부식金富軾의 기문記文이 있다. 다 읽은 후에 북쪽 고개를 넘었는데, 몹시 가팔라 걷기가 쉽지 않았다.
시냇가 길을 따라서 다리를 서너 번 건넜다. 모두 높이가 100척은 되었고, 삼나무 널판을 엮어 만들었다.
순여에서 내려 어기적 어기적 걷는데 벌벌 떨려서 건널 수가 없다. 동쪽에는 별도의 시내가 내려와 흥성
하게 고인다. 엿보니 아주 맑고 그윽하다. 계곡을 뚫고 가서 양양의 삼부연에 이르게 된다고 한다. 신성굴
이 그 곁에 있다. 옛날에는 유명한 승려가 은둔하던 곳이었으나 지금은 폐허가 되었다.

영감사와 사고

한강의 발원지 우통수
20리를 가서 상원사에 도달하였다. 승려를 머물게 하여 밥을 준비히키고 곧바로 중대中臺로 향하였다. 바위를
부여잡고 올라가 10리쯤 가는데 길이 대부분 험하고 무섭다. 사자암을 거쳐 금몽암에 이르렀다. 이름난 샘물이라
해서 샘물을 떠서 마셨더니 그다지 차갑거나 짜릿하지 않고 달고 부드러워 입에 대기 쉽다. 그 맛은 마땅히 상품
上品에 둘 만하다. 육우陸羽로 하여금 차를 끓이는 데 쓰게 하지 못함이 한스럽다. 대개 오대산의 샘물은 각각
별호가 있는데, 이것은 옥계수이다. 서쪽은 우통, 동쪽은 청계, 북쪽은 감로, 남쪽은 총명이라 한다. 암자의 뒤에는
돌사다리가 층지어 위로 뻗어 수십 걸음쯤 되었다. 사리각에 이르렀더니, 뒤에 석축이 보루처럼 된 곳이 둘 있었다.
바위로 이어서 교묘하게 단과 계단을 배치하였으나, 천연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인공으로 만든 것은 아니다. 승려는
말하길, 여기서부터 주봉까지 거듭해서 목구멍 같은 요충지를 만들고 마디마디 석축이 있다고 한다. 이른바 석가가
뼈를 숨겼다는 곳은 그곳이 여기인지 저기인지 확정하지 못하겠다. 그러나 어쨌든, 적멸보각이 석축의 앞에 있다.
다만 방이 비어 있어, 마치 보통 인가의 곁채와 같되, 새벽과 저녁마다 향불을 금몽암의 수승守僧이 받들고 있다.
앞마루에 앉아서 눈을 들어보니, 구름 산이 거의 수백 리에 뻗어 있어 멀고 가까운 곳의 산과 봉우리들이 마치 신
처럼 옹호하고 있다. 이런 풍수는 다른 명산에서 찾아보더라도 비교할 곳이 드무니, 과연 제일가는 풍수이거늘,
그런 풍수가 가만히 쏟아 부어 산출하는 복록이 어디로 돌아가는지 모르겠다. 승려들이 말하길, 한 구역 내의 일만
납자들의 명체命蔕(목숨 꼭지)가 바로 이곳에 있어서, 이곳이 아니라면 불자의 종자가 다 없어지고
말 것이라고 하니,그 말이 또한 우습다.
내려와서 상원사에 이르러 불전과 행랑을 두루 둘러보니 구조물이 아주 많고 수식도 아주 성대하다. 계단은 모두
작은 돌을 정치하게 갈아서 만들어, 치밀하기가 마치 옥구슬을 쌓아둔 듯하다. 경주에서부터 운수해 왔다고 한다.
그리고 범종은 품새가 교묘하고 소리가 굉장하다. 대개 광묘光廟(세조)가 와서 순력할 때에 백관들이 그림자 쫓듯
따라왔을 것이다. 지금의 승료승료僧寮는 모두 당시의 절간 건물이라고 한다. 왼쪽에는 진여각이 있는데, 전각에는
문수보살의 36변태變態(변상도)를 그려 두었다. 그걸 보면서 한바탕 웃을 만하였다.
점심을 먹고 북대北臺로 향하여, 이어서 수목이 조밀하게 덮인 곳으로 들어갔는데, 미끄러운 돌이 많아서 접질리기
쉬웠다. 신택지와 고달명 군은 순여를 버리고 걸어서 갔으나, 나는 순여에 단단히 앉아서 내리지 않았다. 내가 이토록
아주 쇠약하다니! 자기 자신은 안일하면서 남을 수고롭게 하니, 비록 그것이 불가함을 알고는 있다고 하여도 역시 어찌
할 길이 없다. 순여에 앉아 있으면서도, 곧바로 10여 리를 올라가면서 위태위태하여 위로 쳐다보기만 하고 굽어보지를
않았다. 험난함이 극도에 달하여 형세가 변전하여 흡사 빛이 있어 펄쩍 뛰어 올라 오는 듯하니, 마치 양신陽神이 진흙
공을 내는 듯하다. 이로부터 비로소 봉우리의 허리인데도, 바위의 험준함에 고달프게 되어 탄탄하게 갈 수가 없다.
다시 한 등성이를 넘으니 곧 북쪽 암자에 이른다. 높고 깊고 텅 비고 밝아, 여러 곳의 승경을 조망할 수가 있다.
중대사와 비교하면 혼후渾厚함은 미치지 않지만 시원함은 훨씬 낫다. 들어가 먼 산을 바라보니 허공의 비취빛이
하늘에 접해 있어서, 마치 태백산이 가까운 곳에 있는 듯하다. 그리고 첩첩 산마루와 겹겹 산봉우리가 둘러 있는데,
가장 가까운 것은 환희령으로, 일명 삼인봉이다. 공읍하여 이리로 향하고 있는 것이 마치 무슨 마음이라도 있는 듯
하다. 마침 시야의 경색이 밝고 멀며, 하늘 공간이 텅 비고 드넓으며, 일만 그루의 단풍은 빛나는 태양 아래 붉다.
뜰 가득 잎이 진 나무들이 있어서, 잎은 삼나무이고 몸통은 소나무이면서 거죽은 연한 푸른빛을 띠고 엄연하게 모
여 서 있다. 온 산이 모두 이 나무이다. 이른바 감로수가 좔좔 나무통으로 쏟아지는데, 그 맛이 옥계와 같다. 역아
易牙가 아니어라도 치수湽水와 승수澠水의 물맛은 구별할 수 있을 정도다(치수와 승수는 맛이 서로 다른 두 물. 백
공白公이 묻기를 "만약 물에다 물을 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니, 공자가 이르기를 "치수와 승수를 섞어 놓아도
역아는 그것을 구별한다" 하였다.) 포단浦團에서 조금 쉬는데, 흰 안개가 산을 막처럼 감싸다가, 선실(선방)로 모여
들어, 지척도 분별할 수 없다. 암자에 일찍 이르러 와서 이러한 경승을 모두 차지하게 된 것을 다투어 기뻐하였다.
암자의 주지 축경竺敬은 전에 설악에서 면식이 있어, 산에 들어와서도 소식을 주고받았으나, 마침 중대사로 간 후라
서 애석하게도 친구를 잃은 듯하였다. 어스름을 타고 뒤따라 이르러 와서 "하마터면 교비交臂(친구)를 잃어버릴 뻔했
습니다." 라고 하였다. 서로 현도玄道에 대해 이야기 하느라, 열을 올려서 피곤함을 잊었다. 밤이 되자 안개 기운이 갑자
기 걷히고, 현원弦月이 허공 가운데 떠서, 명랑하게 만상萬象의 거죽이 표표하게 걷어지는 듯하다. 다만 순여 메는 담승
擔僧이 방에 가득하여, 정수리가 닿고 발바닥이 서로 엇갈리는 혼잡함이 잇어, 장실丈室(절간의 방)이 비록 맑기는 하지
만 담담한 기미氣味가 아주 모자라기에 한스러웠다. 새벽에 모두 다시 일어났다. 감원紺園을 산보하자, 경납敬衲(승려
축경)이 뒤를 따르매 달그림자가 같이 참여하여, 삼소三笑의 정취를 이룰 만하였다. 내가 경납에게 "늘그막의 소득이
무엇이오?" 라고 물었다. 그는 다만 말하기를 "바깥에 다른 법이 없음을 보지만 간간이 쇠마衰魔에게 붙잡히기 때문에
순일할 수가 없으므로 아마도 3년이 죽을 기한이어서 이 암자에서 법랍을 그치고 말 것이니, 그대가 와서 좌탑에 같이
앉아 함께 주인공(마음)을 부른다면(참선한다면) 좋지 않겠소?" 라고 하였다.
나는 웃으면서 "그렇게 하겠소" 라고 하였다.
이날 60리를 갔다.
이 글은 조선 숙종 때 처사의 삶을 살았던 김창흡(1653~1722)이 오대산을 오른 후 지은 것으로
사대부와 승려의 격의 없는 교유를 담았다. 김창흡은 문학적 재능이 뛰어났으나 남인이 집권하는 기사환국 때
자연 속에 묻혀 살면서 처사로 자임하였다. 27세에 철원의 삼부연三釜淵에 집을 짓고 살면서 거친 옷에 짚신을 신고
어부나 나무꾼과 섞여 지냇다. 이때 삼부연에서 이름을 취하여 호를 삼연三淵이라 하였다. 기사환국으로 아버지
김수항이 사사된 이후에는 아예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았다. 1694년 갑술옥사가 일어나자 김창흡은 반대당
인물을 공격하는데 앞장섰다. 그는 시론時論에 대하여 장문의 편지를 지어 권력을 쥔 사람들을 배척하였다.
하지만 처사 주제에 함부로 남을 비난한다는 힐난도 들었다.
53세의 나이로 설악에 은거하여, 벽운정사 · 영시암 · 완심루 · 갈역정사 등을 짓고 시절에 따라 옮겨 다니면서
은거 하였다. 갈역정사에서 머물 때 종자 최추금이 호랑이에게 물려 죽자 설악을 떠났다. 62세에 잠시 김화 수태
사에 머물다가 평강 부석사로 옮겼다. 그해 가을, 춘천의 곡운동 입구, 면대에 곡구정사를 이루고 평강과 춘천을
래왕하였다. 그러다가 66세에 다시 설악으로 들어갔는데, 이때 「갈역잡영葛驛雜詠」이라는 연작시를 지었다.
1772년, 나이 70세 되던 해, 신임옥사로 맏형이 죽자 애통해 하다가 김언겸의 별장인 가구당에서 세상을 떠났다.
김창흡은 「오대산 유람기」의 마지막에 4미四微 5행五幸의 설을 말하여 감상을 덧붙였다.
대개 이 산은 器가 중후하여 마치 유덕한 군자와 같아서 가볍거나 뾰족한 태도가 조금도 없다.
이것이 첫 번째 승경이다. 궁륭穹隆(아치) 같은 형상을 이룬 수풀과 거대한 수목이 큰 것은 거의 백 아름에
이르고 심지어 구름 속으로 들어가 해를 가리고 있어서. 은은하기가 첩첩 산악과 같으니 청한자 김시습이 말한
'풀과 나무가 빼빽하게 우거져서 속된자들이 거의 이르러 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말하면 오대산이 최고다' 라고
한 것이 정말이다. 이것이 또 하나의 승경이다. 암자가 수풀 깊숙한 곳에 위치하여 곳곳마다 하안거의 참선에
들 수가 있다. 이것이 또 하나의 승경이다. 샘물의 맛이 아주 훌륭하여 다른 산들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이것이 또 다른 하나의 승경이다. 이러한 네 가지 아름다움이 있으므로 아금강亞金剛이라고 부르는 것이 정말
마땅하다. 그런데 장점을 들어서 아스라한 봉우리나 장대한 폭포와 비교한다면 어느 것이 더 뛰어난지
잘 알 수가 없다.
내가 여러 산들을 두루 구영한 것으로 말하면 바로 이 산이 옥진玉振에 해당하기에 더욱 기이한 행운이다.
대개 산에 올라 위를 우러러보고 아래로 굽어보며 재차 어루만진 일이 저 유년시대부터 있었거늘, 흰머리가
되어서야 와서 찾다니, 만남이 늦었다고 탄식하게 된다. 이것이 또 하나의 행운이다. 금년은 다른 해와 같은
것이 아니라, 목숨을 부지하여 험준한 곳으로 도망한 해이거늘, 능히 이러한 유람을 해낼 수 있었으니, 이것
도 행운이다. 산 바깥에서 비를 만났으나 등산을 위한 신발을 갖추자 날이 개어 환하게 되었으니, 이것도 하
나의 행운이다. 단풍잎의 붉은 빛은 색조의 옅고 깊음을 감상하기에 가장 적합하니, 이것도 하나의 행운이다.
혼자만의 흐우치는 두루 원만하기가 어려운데, 네 분과 함께 질탕跌蕩함을 공유하였으니, 이것도 행운이다.
인용: 심경호 著 <산문 기행>
'자연 > 취월당'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선인들의 유람록 <태백산> (0) | 2021.06.03 |
|---|---|
| 선인들의 유람록 <치악산> (0) | 2021.06.03 |
| 선인들의 유람록 <두타산> (0) | 2021.06.02 |
| 선인들의 유람록 <화악산> (0) | 2021.06.01 |
| 선인들의 유람록 <설악산 2편> (0) | 2021.05.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