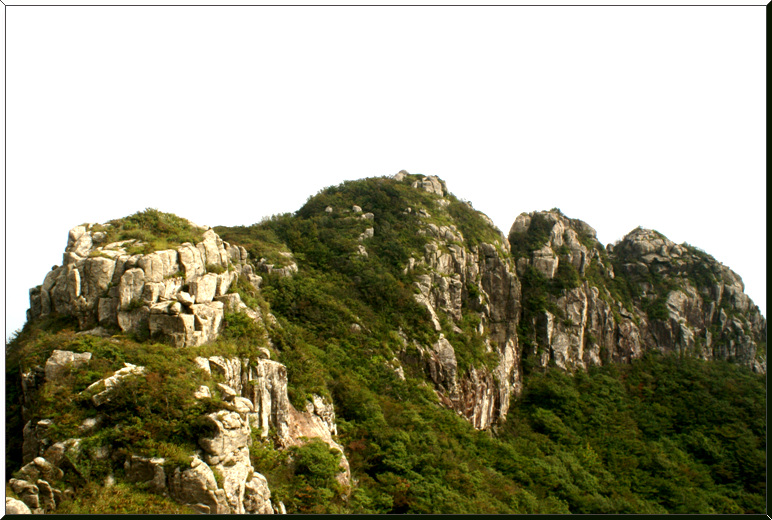차 문화 소고 (6)
김명희가 향훈 스님을 위해 써준 「다법수칙」
산천 김명희의
「다법수칙」
추사의 동생 산천(山泉) 김명희(金命喜, 1788-1857)가 역시 향훈에게 보낸 친필인 「다법수칙(茶法數則)」. 향훈에게 채다(采茶)와 제다법(製茶法)에 대해 6개 항목에 걸쳐 써준 내용이다. 초의의 『다신전(茶神傳)』과 함께 조선 차문화사의 대단히 중요한 글이다. 이제 이 글을 쓰게 된 전후 사정을 살펴보고, 원문을 소개한 후 자료가치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새 자료 「다법수칙」에 대하여
「다법수칙」은 누가 언제 왜 쓴 것일까? 이 자료는 모두 7면에 걸쳐 경쾌하고 유려한 산천의 친필 행초체로 적혀 있다. 각면 끝에 면수를 작은 글자로 적어 놓았다. 필자가 보기에 원래는 위 사진 자료에서 보듯 긴 종이에 잇대어 쓴 것을 뒤에 한 장씩 잘라 따로 첩장한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본 것은 복사본으로 원본의 소재는 현재 알 수가 없다.
내용은 채다(採茶)와 제다(製茶)에 관한 여섯 항목의 짤막한 글이다. 글 끝에는 다음과 같은 후기가 적혀 있다.
다법 몇 항목을 써서 견향(見香)에게 보인다. 이 방법에 따라 차를 만들어 중생을 이롭게 한다면 부처님의 일 아님이 없을 것이다. 산천거사.
茶法數則, 書贈見香, 要依此製茶, 以利衆生, 無非佛事耳. 山泉居士.
산천은 추사의 동생 김명희(金命熙)다. 김명희가 견향(見香), 즉 대둔사 승려 향훈(香薰) 스님에게 써준 것이다. 여기 적힌 방법대로 차를 만들어서, 이를 통해 중생을 이롭게 하고 나아가 부처님 전에 공덕을 쌓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원래 글의 제목이 따로 없지만, 위 글 첫머리에 ‘다법수칙’이라 한 것을 표제로 삼는다.
여기에 적힌 여섯 항목의 내용은 김명희가 직접 지은 것이 아니다. 서유구(徐有榘, 1764-1845))의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 권 27에 실린 『만학지(晩學志)』 권 5, 「잡식(雜植)」조의 차 관련 내용 중에서 간추렸다. 산천이 직접 중국 다서를 보고 베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원문을 대조해보니 서유구가 옮겨 적으면서 생략한 대목이나 원본과 다르게 적은 몇 글자가 동일한 것으로 보아, 서유구의 저술에서 추려 적은 것이 분명하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피기 전에, 산천이 인용한 항목별 서목을 잠깐 검토해본다.
1. 송 조길(趙佶), 『대관차론(大觀茶論)』 중 「채택(采擇)」조
2. 송 조여려(趙汝礪), 『북원별록(北苑別錄)』 중 「채다(採茶)」조
3. 명 허차서(許次紓), 『다소(茶疏)』 중 「채적(採摘)」조
4. 명 허차서(許次紓), 『다소(茶疏)』 중 「초차(炒茶)」조
5. 명 도륭(屠隆),『다전(茶箋)』 중 「채다(採茶)」조
6. 명 문룡(聞龍),『다승(茶箋)』 중 첫 항목
『대관차론』과 『북원별록』, 『다소』와 『다전』, 『다전(2)』 등 모두 5종 다서에서 6단락을 인용했다. 『대관차론』은 송나라 휘종황제 조길(趙佶)이 지었다. 차를 심는 일에서 찻잎 채취, 차 제법과 품상(品賞)에 이르는 내용을 담았다. 대관(大觀)은 휘종의 연호(1107-1110)다. 『북원별록』은 송나라 조여려(趙汝礪)가 지었다. 남송 효종(孝宗) 때 사람이다. 웅번(熊蕃)의 『선화북원공다록(宣和北苑貢茶錄)』을 보완하기 위해 지었다. 『다소』는 명나라 허차서(許次紓, 1549-1604))의 저술이다. 고금의 제다법을 참고하여 채다에서 음다까지 차문화의 제 방면을 간추려 저술했다. 『다전』은 명나라 도륭(屠隆)(1542-1605)가 지었다. 그의 저작인 『고반여사(考槃餘事)』 중의 일부분인데 따로 떼어 이렇게 부른다. 차의 주요 산지와 채다법, 보관법, 찻물론, 찻그릇, 그리고 차의 효능까지 정리한 글이다. 『다전(2)』는 명나라 문룡(聞龍)이 1630년 전후 하여 편찬한 다서다.
이렇듯 산천의 『다법수칙』은 송대와 명대의 5종 다서에서 한 두 항목을 초록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1, 2, 3, 5는 모두 찻잎 따는 요령과 시기를 다룬 채다(採茶)의 내용이고, 4와 6은 차덖기에 관한 내용이다. 그밖에 보관이나 찻물, 차 끓이기에 관한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이는 이 글이 단지 차를 따서 덖는 과정에 도움을 주려고 필사된 것임을 말해준다.
추사는 이전부터 초의와 향훈에게서 차를 얻어 마시고 있었다. 그 차를 산천도 나눠 마셨다. 그런데 산천이 왜 새삼스럽게 차를 만들고 덖는 방법에 대해 글로 써서 향훈에게 보낸 걸까? 향훈이 바른 제다방법을 산천에게 물었거나, 아니면 향훈이 만든 차 맛에 부족한 점이 있는 듯하여, 제다법을 일러주려 했던 듯하다. 이 방법대로 만들라고 한 언표로 보아 당시까지도 차 만드는 방법이 온전하게 자리잡지 못했던 형편을 가늠할 수 있다. 이는 초의나 향훈 당시 조선에 이렇다 할 제다 이론이 없었고, 중국 다서를 참조하여 실험해보고 적용해보는 단계에 머물렀다는 뜻이 된다. 초의도 명나라 장원의 『다록』를 베껴서 『다신전』이란 제목으로 묶은 일 또한 제다 이론의 정립 과정에서 근거로 삼기 위한 것이었다.
전남 보성의 차밭.
「다법수칙」의 채다법
이제 위 여섯 항목을 채다법과 초다법으로 나눠 차례로 살펴보기로 하자.
원문은 처음에 서유구가 중국 다서를 옮겨 적으면서 필요에 따라 일부 내용을 삭제한 것이 있다.
해당 원문 중 [ ] 부호로 표시한 것은 원전 상태를 보여준다. 전사 과정의 명백한 오자는 원문에서 바로 잡았다.
[1] 차를 따는 것은 동트기 전에 하여 해가 나면 그만 둔다.
손톱을 써서 싹을 끊어야지 손가락으로 짓무르게 하면 안 된다.
기운이 오염되고 내음이 스며 차가 깨끗하지 않게 될까 염려해서이다.
그런 까닭에 찻 일은 흔히 새로 길은 물을 뒤따르게 하여 싹을 따면 물에다 넣는다.
무릇 싹이 참새 혀나 낟알 같은 것을 투품(鬥品)으로 치고, 일창일기(一槍一旗)는 간아(揀芽)로 여기며,
일창이기(一槍二旗)는 그 다음이고, 나머지는 하품(下品)이다.
찻잎 채취에 알맞은 시간과 채취 요령을 적었다. 찻잎의 채취는 해 뜨기 전에 시작해서 해가 뜨면 그만 둔다.
반드시 손톱으로 싹을 끊고, 손가락으로 짓무르게 하지 말라고 했다. 진이 나와
기운이 오염되고 잡내가 스미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특이한 점은 맑은 물을 길어 찻잎을 따는 즉시 물에다 담가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막게 한 것이다.
가장 상등품은 작설(雀舌) 즉 참새 혓바닥이나 곡식의 낟알처럼 이제 막 움터나 잎이 채 펴지도 않은 첫 싹을 꼽는다.
그 다음이 일창일기(一槍一旗)다. 일창일기는 찻잎이 처음 나올 때 창처럼 곧추서서 채 펴지 않은 잎과
그 옆에 깃발처럼 펴친 한 잎이 달린 상태를 말한다. 그 다음은 다시 일창 옆에 두 잎이 펴진 상태다.
산천의 원문은 ‘이창이기(二槍二旗)’라고 썼는데, 『대관차론』의 원문에 따른다. 서유구의 오자를 그가 그대로 베껴 쓴 결과다.
이로만 본다면 당시 서유구나 산천 또한 실제 찻잎의 모양이나 찻잎의 성질에 대한 깊은 이해가 부족했음이 드러난다.
이후 한 줄기에 여러 잎이 돋아나면 하품으로 친다.
이러한 구분은 지금도 크게 다를 것이 없다.
다만 찻잎을 채취할 때 맑은 물을 길어 찻잎을 따는 대로 물에 담그라고 한 점이 특이하다.
[2] 차를 따는 방법은 모름지기 새벽에 작업을 해서 해를 보게 하면 안 된다.
새벽에는 밤 이슬이 아직 마르잖아 차싹이 살지고 촉촉하다.
해를 보면 양기에 엷어지는 바가 되어, 싹의 기름진 것을 안에서 소모시키므로 물에 담궈도 선명하지 않게 된다.
이 글에서도 역시 찻잎 채취를 해 뜨기 전에 시작해서 마칠 것을 요구했다. 그 이유도 설명했다.
동트기 전에는 찻잎이 밤 이슬에 젖어 차싹이 수분을 머금고 있기 때문이다.
해가 뜬 뒤에는 양기(陽氣)가 왕성해져서 수분이 엷어진다.
그 결과 차싹의 기름기가 소모되어, 물에 담궈도 빛깔이 선명하지 않게 된다고 적었다.
[3] 청명과 곡우는 차를 딸 때이다. 청명은 너무 이르고, 입하는 너무 늦다. 곡우 전후가 가장 알맞은 때다.
만약 다시 하루 이틀 기간을 지체하면서 기력이 완전히 채워지기를 기다리면, 향기가 배나 더 짙어지고 거두어 보관하기가 쉽다.
[매실이 익을 때는 덥지가 않아] 비록 조금 크게 자라더라도 여전히 여린 가지요 보드라운 잎이다.
이 항목은 1년 중 차를 따는 시기에 대해 언급했다. 청명과 입하 사이가 차를 따는 시기인데,
청명은 너무 이르고, 입하는 너무 늦으므로 곡우를 전후한 시기가 가장 적기라고 했다.
혹 날씨에 따라 찻잎에 기력이 충분치 않아 보이면, 곡우를 지나서도 오히려 하루 이틀 더 기다려 적절한
발육을 보일 때 채취해야 향이 더욱 짙고 보관도 용이하다고 적었다.
매실이 익을 무렵에는 아직 날이 찌지 않아, 찻잎이 크게 자랐다 해도 여전히 여린 잎이어서 차로 만드는데 문제가 없다.
다만 초의는 『동다송』의 주석에서
『만보전서』에서는 곡우 닷새 전이 가장 좋고, 닷새 뒤가 그 다음이며, 다시 닷새 뒤가 그 다음이라고 적은 내용을
소개하고 나서, 자신의 경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곡우 전후는 너무 이르고, 입하 이후가 가장 좋다고 보았다.
또한 입하 이후에 밤새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 동트기 전 이슬 머금은 잎을 딴 것이 가장 좋고,
그 다음은 해가 났을 때 딴 것이며, 비올 때는 찻잎을 따면 안 된다고 적었다.
찻잎의 채취 시기는 각 지역의 기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당연하다.
초의의 위 언급은 그가 중국 다서를 교조적으로 따르기만 한 것이 아님을 잘 보여준다.
실제 최근 들어서는 봄이 앞당겨져서 아예 청명 이전에 채취한 찻잎으로 만든 명전차(明前茶)까지 출시되는
것으로 보아, 채다 시기는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야 한다는 [3]의 언급은 매우 중요한 시사를 준다.
[5] 차를 딸 때는 너무 가는 것은 딸 필요가 없다.
가늘면 싹이 갓 움터서 맛이 부족하다. 너무 푸를 것도 없다. 푸르면 차가 쇠어서 여린 맛이 부족하다.
모름지기 곡우 전후에 줄기가 잎을 두르기를 기다려 옅은 녹색에 둥굴고 두터운 것이 상품이다.
[5]는 찻잎을 채취할 때 유념해야 할 찻잎의 모양과 빛깔에 관한 내용이다.
너무 가는 잎은 맛이 충분히 배지 않았으므로 따지 말고, 푸른 것은 너무 쇠었다는 증거니 역시 따지 않는 것이 좋다고 했다.
곡우 전후에 일창이기, 일창삼기 쯤 되었을 때, 잎 빛깔은 연녹색을 띠고, 잎 모양은 둥글고 도톰한 것이
가장 상품이라고 적었다. 이점은 오늘날도 같다.
이상 네 항목의 채다법을 정리하면 이렇다.
첫째, 하루 중에는 동트기 전에 찻잎을 따야 한다.
둘째, 찻잎을 딸 때는 손톱으로 끊어야지 손가락으로 짓무르게 하면 안 된다.
셋째, 일년 중에는 곡우 전후한 시기가 채다의 가장 적기다. 시기가 좀 늦더라도 맛이 밴 뒤에 따야 향이 좋다.
넷째, 잎은 연녹색에 둥글고 도톰한 것이 상품이다.
다섯째, 채취한 찻잎은 맑은 물에 즉시 담궈 두는 것이 좋다.
「다법수칙」의 초다법炒茶法
나머지 두 항목은 차덖기에 관한 내용이다. 차례로 보자.
[4] 생차를 처음 따면 향기가 아직 스미지 않아 반드시 불의 힘을 빌어서 그 향기를 펴낸다.
하지만 성질이 힘든 것을 견디지 못하기에 오래 덖으면 안 된다. 너무 많이 가져다가 솥에 넣으면 손의 힘이
고르지가 못하다. 솥 가운데 오래 두면 너무 익어서 향기가 흩어진다. 심하여 타버리면 어찌 차를 끓일 수 있겠는가.
차 덖는 그릇은 신철(新鐵), 즉 새것의 쇠를 가장 싫어한다. 쇠 비린내가 한번 배면 향기가 다시는 나지 않는다.
더 꺼리는 것은 기름기이니, 쇠보다 해로움이 심하다.
[모름지기 미리 솥 하나를 취해, 오로지 밥을 짓는데만 쓰고 따로 다른 용도로는 쓰지 않는다.]
차를 덖는 땔감은 나뭇가지만 쓸 수 있고 둥치나 잎은 쓰지 않는다. 둥치는 불의 힘이 너무 맹렬하고, 잎은 불이 쉬 붙지만
금세 꺼진다. 솥은 반드시 깨끗이 닦아 잎을 따는 즉시 바로 덖는다.
솥 하나 안에는 다만 4냥만 넣는다. 먼저 문화(文火) 즉 약한 불로 덖어 부드럽게 하고, 다시 무화(武火) 곧 센 불을 더해
재촉한다. 손에는 대나무 손가락을 끼고서 서둘러 움켜서 섞는다. 반쯤 익히는 것을 법도로 삼는다.
은은히 향기 나기를 기다리니, 이것이 바로 그때이다.
생차에는 차향이 배이지 않아, 불의 힘을 빌어서 향을 펴나오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여린 찻잎이라 열기에 약하므로
오래 덖으면 향기가 다 흩어지고 만다. 또 한꺼번에 너무 많이 덖어도 안 된다. 손의 힘이 고르게 미칠 수 없기 때문이다.
심한 경우 차가 타기라도 하면 버린 물건이 된다. 가장 금기해야 할 것은 새 철의 날내가 배는 것이다. 차향에 쇠 비린내는
치명적이다. 또 차는 기름기를 몹시 꺼리므로, 차를 덖는 솥에는 기름기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 차를 덖는 솥에 밥 짓는 것 외에 다른 음식을 조리하지 말아야 한다.
그 다음은 차를 덖을 때 쓰는 땔감이다. 나뭇가지만 써야지 통나무나 잎을 쓰면 안 된다. 통나무는 화력이 너무 세서
찻잎을 태우기 쉽고, 잎은 너무 약해 금세 꺼지기 때문이다. 찻잎은 따는 즉시 묵혀 두지 말고 바로 덖어야 한다.
한 솥에는 4냥 이상을 넣으면 안 된다. 처음에는 약한 불로 기운을 부드럽게 하고, 센 불로 마무리를 한다.
손가락에 대나무를 가락지처럼 끼워 뜨거운 찻잎을 고루 섞어주어야 한다. 반만 익혀야지 푹 익히면 안 된다.
찻잎에서 은은한 향기가 코 끝에 훅 끼쳐오는 바로 그때가 덖기를 마쳐야 할 가장 적절한 시점이다.
[6] 덖을 때는 모름지기 한 사람이 곁에서 부채질을 해주어 열기를 없애야 한다. 뜨거우면 황색이 되어, 향과 맛이 모두 줄어든다.
[6]은 덖을 때의 주의사항을 추가했다. 차솥에서 김이 무럭무럭 오르면 곁에서 부채질을 해서 뜨거운 열기가 엉기지 않도록 한다.
너무 뜨겁게 되면 빛깔이 황색으로 변하고, 향과 맛이 그만큼 줄어든다.
초다법을 정리하면 이렇다.
첫째, 여린 잎을 오래 덖거나 한꺼번에 너무 많이 덖으면 안 된다.
둘째, 한 솥에 한꺼번에 덖는 분량은 4냥 이하가 적합하다.
셋째, 화기가 지나쳐서 태우면 절대로 안 된다.
넷째, 쇠솥의 날 비린내가 배거나 기름기가 스며도 안 된다.
다섯째, 찻잎을 덖을 때는 나뭇가지를 써야지 통나무나 잎을 쓰면 안 된다.
여섯째, 찻잎을 고루 섞어 주려면 손가락에 대나무를 깍지 끼워 쓰면 좋다.
일곱째, 차를 덖다가 향기가 올라 올 때 덖기를 멈추어야 한다.
여덟째, 곁에서 부채질을 해서 열기를 걷어내 주어야 한다.
이상 산천 김명희가 향훈 스님에게 준 「다법수칙」 6항목을 꼼꼼히 읽어 보았다.
내용은 찻잎 채취의 방법과 시기를 적은 채다법과, 찻잎을 덖을 때 주의 사항을 적은 초다법으로 구분된다.
이 글은 향훈에게 채다와 초다의 방법을 일러주기 위해 산천이 중국 차서의 내용을 옮겨 적은 것이다.
이는 앞서도 말했듯이 초의를 비롯하여 여러 승려들이 다투어 차를 만들고는 있었지만,
막상 이렇다 할 제다법이 정립되어 있지 않았던 당시 조선 차문화의 현주소를 말해준다.
정작 산천 자신은 제다에 경험이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차의 생태나 성질도 잘 알지는 못했다.
하지만 중국의 다서를 읽음으로써 그 과정을 체득했고, 이를 향훈에게 요령있게 가르쳐 주어 그가 만든 차맛이
한결 더 높은 수준에 이르도록 기여한 공이 있다. 실제 산천은 서유구의 『임원경제지』를 다시 인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그저 이론으로 섭렵한 데 그친 서유구에 비해 산천의 「다법수칙」은 바로 향훈에게 전해져서 실전에 적용되었다.
초의의 『다신전』과 함께 산천의 『다법수칙』이 차문화사에서 의미를 갖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산천 김명희의 「사차 謝茶」시와 초의의 제2다송
앞서 살폈듯 산천(山泉) 김명희(金命喜, 1788-1857)는 향훈(香薰)에게 「다법수칙(茶法數則)」을 써주었을만큼
차를 몹시 즐겼을 뿐 아니라, 그의 호가 말해주듯 샘물에도 관심이 높았다. 초의가 보내온 차를 마시고 감사의
뜻을 담은 「사차(謝茶)」시가 초의의 『일지암시고』에 수록되어 있거니와, 초의 또한 이에 화답한 시를 남겼다.
이번 호에서는 산천과 초의의 수창시를 꼼꼼히 읽어 보겠다.
산천과 초의의 인연
산천과 초의의 첫 대면은 1815년 초의가 처음으로 상경했을 때 이루어졌다. 이후 두 사람은 만날 기회를 갖지 못했다.
그러다가 1830년 10월 8일 추사의 부친 유당(酉堂) 김노경(金魯敬)이 정쟁에 몰려 강진현에 속한 고금도(古今島)로
위리안치 되면서 다시 왕래가 재개되었던 듯하다. 당시 다산의 아들 정학연은 강진에 있던 다산의 제자들에게 친구인
추사의 부친을 돌보게끔 했다. 이 과정에서 초의를 비롯한 대둔사 승려들도 추사 형제가 부친을 뵈러 고금도에 내려오자
유당도 보살필 겸 이들을 만나기 위해 찾아갔던 모양이다. 『일지암시고』에 실려 있는
「금호에서 산천도인과 유별하다(琴湖留別山泉道人)」란 시에 이때의 일이 적혀 있다.
憶曾傾蓋西館雪 일찍이 눈 오던 서관(西館)에서 만났을 때
更闌華燭光明滅 밤 깊자 화촉 불빛 모두 다 사위었지.
颯爽不似在人間 상쾌하여 인간에 있는 것 같지 않고
爲近仙子氷玉潔 신선에 가까워서 빙옥인양 깨끗했네.
忽間氛䘲久冥冥 홀연 나쁜 기운 오래도록 깜깜하여
海闊天長鱗鴻絶 넓은 바다 긴 하늘에 소식조차 끊겼었지.
참소로 인해 10여년이나 소식이 끊어졌다(-因讒阻絶十有餘年) .
明月久曠同澄輝 밝은 달 오래어도 맑은 빛은 한가진데
白雲空復淸怨結 흰 구름 하릴없이 맑은 원망 맺혔구나.
天涯涕淚爲汍瀾 하늘가서 흘린 눈물 하염없이 흐르니
舊日天機還高挈 지난 날의 천기(天機)가 도로 높게 이끄누나.
고호(古湖)에서 본 뒤로 다시 예전처럼 좋아졌다.(古湖見後, 還如舊好)
蘭操細將幽恨傳 고운 가락 세세히 그윽한 한 전해주니
償音最是關情切 노래 듣자 마음 끌림 몹시도 간절해라.
當時世事何崢嶸 당시의 세상 일은 어찌 그리 험했던고
太行孟門同嶻嶭 태항산 맹문산과 높고 험함 꼭 같았네.
千里忽傳新安耗 천리라 홀연히 신안(新安) 소식 전해지니
공이 고호에 있을 적에 요절의 슬픈 소식을 들었다.(公在古湖, 聞夭慼之報)
人間何怨可相埓 인간 세상 어떤 원망 여기에다 견주리오.
我亦曾看英妙姿 나도 진즉 영묘한 자태를 보았거니
玉蘭銀桂藹將擷 옥란(玉蘭)과 은계(銀桂)가 우거져 캘만 했네.
我若詳言恐斷腸 내 자세히 말을 하면 애 끊을까 염려되어
爲君且置休煩說 그댈 위해 공연한 말 놓아두고 그만하리.
扶旺今日泰運來 오늘은 왕성하게 큰 운이 돌아와서
琴堂影翠摩漢洌 금당(琴堂) 푸른 그림자가 한강물에 비치누나.
사면을 받아 서올로 올라왔을 때 금호(琴湖)에서 지냈다.(蒙宥上洛時居琴湖.)
三秋高會窮憐歡 삼추의 고회(高會)에서 슬픔 기쁨 다 나누며
-甲午秋重會琴石亭 갑오년(1834) 가을에 다시 금석정(琴石亭)에서 만났다.
閒碾鳳團燒鷄舌 한가로이 봉단(鳳團) 갈고 계설향(鷄舌香)을 살랐다네.
人生聚散苦難常 인생 만나 헤어짐이 일정찮음 괴로운데
凄勵風前復遠別 차고 매운 바람 맞고 다시 멀리 헤어진다.
또 남겨두고 작별하여 남쪽으로 돌아간다. (又留別南歸 )
醉德飽義更何時 덕에 취하고 의에 배불릴 날 다시 어느 때일런가
此身還復如飢餮 이 내 몸 도리어 굶주려 배고픈 듯.
1834년 가을에 초의는 철선(鐵船)과 향훈(向薰), 자흔(自欣) 등과 함께 상경했다.
산천과 불등(佛燈)에 걸고 약속한 금강산 유람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때 산천이 중병을 앓아
여행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이들은 수십 일 동안 불경 이야기를 나누면서 산천의 병구완을 하며 지냈다.
위 시는 해남으로 돌아갈 때 산천에게 작별 선물로 지어준 시다.
초의는 자신이 산천과 처음 만난 곳을 서관(西館)이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지 분명치 않다.
두 사람은 첫 대면에서부터 의기가 통해 밤새도록 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나서는 참소로 인해 10여년 간 소식이 끊어졌다고 했다. 이후 추사 집안에 불어 닥친 정쟁의 회오리를 두고 한 말이다.
그러다가 고호(古湖)에서 다시 만나 예전의 우의를 회복하게 되었다.
고호는 1830년 이후 4년간 유당이 귀양 와 있던 고금도(古今島)를 가리킨다.
시를 보면 당시 산천이 부친을 모시려고 고금도로 내려와 있을 때 아들이 요절하는 참척을 겪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아들은 초의가 10여년 전 처음 만났을 당시 이미 영묘한 자태를 보았다고 했으니, 근 20세에 가까운 나이였을 것이다.
장성한 자식이 갑작스레 세상을 뜨자, 산천의 충격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법 하다.
이후 1834년 가을 상경 시에 초의 일행은 한강가 금호(琴湖)에 있던 추사의 별장에서 잠시 묵었다.
그곳의 금석정(琴石亭)에서 초의가 가져온 떡차인 봉단차(鳳團茶)를 차맷돌에 가루내어 차를 끓이고,
정향나무 꽃잎으로 만든 계설향(鷄舌香)을 피우며 반가운 재회의 자리를 가졌다.
산천의 아우인 기산(起山) 김상희(金相喜)도 이때 초의차를 받고서 「사차장구(謝茶長句)」를 지어 사례하였고,
초의가 이에 화답한 시가 『일지암시고』에 실려 있다. 기산의 시는 남아 있지 않다.
김홍도의 「취후간화(醉後看化」국립박물관 소장.
산천의 「사차」시
1834년 만남 이후 두 사람은 또 한 동안 서로 대면하지 못했다.
1838년 초의는 4년 전에 이루지 못한 금강산 유람을 실행에 옮겼고, 이후 동대문 밖 청량사 등에서 머물렀다.
1840년 이번에는 추사가 제주로 유배를 갔다. 초의는 1843년에 바다를 건너가 추사를 만났으나,
산천과의 회면은 이뤄지지 않았다. 1848년 추사가 해배되어 상경하면서, 초의차를 요구하는 추사의 편지가
과천과 해남 사이를 끊임없이 오간다. 다음 시는 1850년, 초의차를 받은 김명희가 감사의 뜻을 담아
초의에게 보낸 「사차(謝茶)」시다. 이 시를 지을 당시 산천은 이미 63세의 노인이었다.
『일지암시고』에는 「부원운(附原韻)」이라 하였고, 시 끝에 다음과 같은 긴 글이 제목 대신 들어 있다.
학질을 앓아 갈증이 심하므로 신령한 차를 청했다.
근래 연경의 시장에서 구입해 온 것은 비단 주머니에 수 놓은 천으로 싸서 한갓 겉치장만 힘쓸 뿐
거친 가지와 질긴 잎이 차마 입에 넣을 수가 없다. 이러한 때 초의가 부쳐온 차를 얻으니,
응조(鷹爪)와 맥과(麥顆)가 모두 곡우 이전의 좋은 제품이었다. 한 그릇을 다 마시지도 않았는데,
문득 번열을 씻어내고 갈증을 해소시키니, 전씨(顓氏)의 갑옷은 이미 저만치 멀리 물러나고 말았다.
고려 때 차를 심게 하여 토산의 공물과 대궐의 하사품을 모두 차로 썼다.
5백년 이래로 우리나라에 차가 있는 것을 알지 못했는데,
이를 따고 덖어 묘함이 삼매에 든 것은 초의에게서 처음으로 얻었다.
공덕이 참으로 무량하다. 산천 노인이 병든 팔뚝으로 쓴다.
老夫平日不愛茶 이 늙은이 평소에 차 즐기지 않았는데
天憎其頑中瘧邪 하늘이 미워하여 학질에 걸렸다네.
不憂熱殺憂渴殺 열 나는 것 걱정 않고 갈증 심함 염려되어
急向風爐瀹茶芽 급히 풍로(風爐) 가져다가 차싹을 달인다네.
自燕來者多贋品 연경(燕京)에서 들여온 것 가짜가 많다하니
香片珠蘭匣以錦 향편(香片)이니 주란(珠蘭)이니 비단 갑에 담았구나.
曾聞佳茗似佳人 듣자니 좋은 차는 고운 여인 같다는데
此婢才耳醜更甚 이 계집종 재주 용모 추하기 그지없다.
艸衣忽寄雨前來 초의 스님 갑자기 우전차(雨前茶)를 부쳐오니
籜包鷹爪手自開 대껍질 싼 응조차(鷹爪茶)를 손수 직접 끌렀다네.
消壅滌煩功莫尙 막힘 뚫고 번열(煩熱) 씻음 그 공이 대단하여
如霆如割何雄哉 우레 같고 칼 같으니 어이 이리 웅장한가.
老僧選茶如選佛 노스님의 차 고르기 부처를 고르듯 해
一槍一旗嚴持律 일창일기(一槍一旗) 여린 싹만 엄히 지켜 가렸다네.
尤工炒焙得圓通 덖어 말림 솜씨 좋아 두루 통함 얻으니
從香味入波羅蜜 향기와 맛을 따라 바라밀(波羅蜜)로 드는구나.
此秘始抉五百年 이 비법 5백년에 비로소 드러나매
無乃福過古人天 옛 사람 그때보다 내 복이 훨씬 낫네.
明知味勝純乳遠 그 맛은 순유(純乳) 보다 훨씬 나음 알겠거니
不恨不生佛滅前 부처님 계실 적에 나지 못함 유감 없네.
茶如此好寧不愛 차가 이리 좋으니 어이 아끼잖으리오
玉川七椀猶嫌隘 노동(盧仝)의 일곱 잔도 오히려 부족하다.
且莫輕向外人道 가벼이 외인에게 말하지 마시게나
復恐山中茶出稅 산 속의 차에 대해 세금 매김 염려되니.
평소에 자신이 차를 그다지 즐기지 않았는데,
그 잘못을 하늘이 미워해서 자신이 학질에 걸리게 되었노라며 말문을 열었다.
열 나는 것이야 그러려니 한다 해도, 갈증이 나서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 것만은 견디기가 어려웠다.
그제서야 차 생각이 나서 풍로를 가져오게 해 차를 달이기 시작한다.
그 차는 어떤 차인가? 초의가 부쳐온 우전차다.
산천은 시 앞에 수록한 글과 시의 중간 부분에서 당시 중국에서 흔히 들어왔던 형편 없는 품질의 가짜 차에 대해 성토했다.
중국차는 비단 주머니에 수놓은 천으로 차를 포장해서 향편(香片)이니 주란(珠蘭)이니 하는 그럴듯한 이름을 붙여 놓았다.
막상 차를 끓여보면 가지는 거칠고 잎은 질겨서 향은커녕 입에 댈 수조차 없을 지경이었다. 산천은 좋은 차는 가인(佳人)과
같다고 한 소동파의 싯귀를 끌어 온 뒤, 중국에서 들여온 차는 재주와 용모가 몹시 추악해서
차마 봐줄 수 없는 계집 종과 같다고 비유했다.
그러다가 초의 스님이 부쳐온 곡우 전에 딴 응조차(鷹爪茶)와 맥과차(麥顆茶)를 마주했다.
응조는 매발톱이고, 맥과는 보리 알갱이다. 채 펴지 않은 차의 첫잎을 형용한 것이다.
그러니까 응조차니 맥과차니 말하는 것은 곡우 전에 딴 첫물차라는 말이다.
이어 산천은 초의차의 포장 상태와 효능에 대해서도 적었다. 포장은 탁포(籜包), 즉 대나무 껍질로 쌌고,
응조와 맥과라 했듯이 일창일기(一槍一旗)의 여린 싹만을 엄선해서 덖고 말리는 수단을 발휘했다.
효능은 ‘소옹척번(消壅滌煩)’ 즉 막힌 체증을 뚫어주고 번열(煩熱)을 씻어내 준다고 했다.
전씨의 군대가 저만치 물러나고 말았다는 것은 온 몸을 옥죄던 답답한 기운이
활짝 가시어져서 흔적 없이 되었다는 의미다.
또 우리나라가 고려 때 토산의 공물과 대궐에서 신하에게 내리는 하사품을 모두 차로 썼을만큼 차문화가 진작에 발전하였으나,
지난 500년간 적막하게 단절되어 차가 무슨 물건인지조차 모르게 되었는데, 초의에 와서 그 단절을 메워 제다의 비법이
복원될 수 있었으니, 공덕으로 쳐도 큰 공덕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끝은 차맛이 이다지도 훌륭하므로,
공연히 바깥 사람에게 알려져서 차에 세금을 매기게 되거나,
이런저런 요청으로 성가시게 될 것이 걱정이란 말로 맺었다.
제 2의 다송(茶頌), 초의의 답시
산천의 「사차」시를 받아든 초의는 다시 같은 운자로 답시를 썼다.
초의가 정학연과 김상희의 사차시를 받고 쓴 답시가 문집에 실려있지만, 다른 시에는 차와 관련된 내용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에 반해 초의의 이 답시는 「동다송」에 이은 제 2의 다송(茶頌)이라 해도 손색이 없을만큼 차에 대한 깊은 논의를 담았다.
제목은 「산천도인의 사차시에 삼가 화운하여(奉和山泉道人謝茶之作)」이다. 경술년(1850)에 지었다.
古來賢聖俱愛茶 예로부터 성현은 모두 차를 아꼈나니
茶如君子性無邪 차는 마치 군자 같아 성품에 삿됨 없다.
人間艸茶差嘗盡 세상의 풀잎 차를 대충 맛을 다 보고서
遠入雪嶺採露芽 멀리 설령(雪嶺) 들어가서 노아차(露芽茶)를 따왔다네.
法製從他受題品 법제하여 이를 통해 제품(題品)을 받고서는
玉壜盛裹十樣錦 옥그릇에 갖은 비단 감싸서 담았다네.
水尋黃河㝡上源 황하의 맨 위 근원 그 물을 찾고 보니
具含八德美更甚 여덟 덕을 두루 갖춰 더욱더 훌륭하다.
『서역기(西域記)』에 말했다. “황하의 근원은 아욕달지(阿褥達池)에서 처음 나온다. 물이
여덟 가지 덕을 머금어, 가볍고 맑고 차고 부드럽고 아름다우며, 냄새나지 않고, 마실 때
알맞으며, 마신 뒤에 병이 나지 않는다.”
(西域記云: 黃河之源, 始發於阿褥達池. 水含八德, 輕淸冷軟美, 不臭, 飮時調適, 飮後無患.)
深汲輕軟一試來 경연수(輕軟水) 깊이 길어 한차례 시험하자
眞精適和體神開 참된 정기 마침 맞아 체(體)와 신(神)이 열리누나.
『다서』「천품(泉品)」에 말했다. “차란 것은 물의 신이고, 물은 차의 몸체다. 참 물이
아니고서는 그 신을 드러낼 수가 없고, 좋은 차가 아니라면 그 체를 살피지 못한다.
(茶書泉品云: 茶者水之神, 水者茶之體. 非眞水莫顯其神, 非精茶莫窺其體.)
麤穢除盡精氣入 나쁜 기운 사라지고 정기(精氣)가 들어오니
大道得成何遠哉 큰 도를 얻어 이룸 어이 멀다 하리오.
持歸靈山獻諸佛 영산(靈山)으로 가져와서 부처님께 올리고
煎點更細考梵律 차 달임 더욱 따져 범률(梵律)을 살피었네.
閼伽眞體窮妙源 알가(閼伽)의 진체(眞體)는 묘한 근원 다하였고
범어로 ‘알가화(閼加花)’는 차를 말한다.(梵語閼加花言茶.)
妙源無着波羅蜜 묘한 근원 집착 없어 바라밀(波羅蜜)이 그것일세.
-『대반야경』에 말했다. “일체의 법에 집착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바라밀이라 한다.”
(大般若 經云: 於一切法無所執着, 故名波羅蜜.)
嗟我生後三千年 아아! 나는 삼천년이 지난 후에 태어나
潮音渺渺隔先天 물결 소리 아득해라 선천(先天)과 막혔구나.
妙源欲問無所得 묘한 근원 묻자 해도 물을 곳이 바이 없어
長恨不生泥洹前 부처님 열반 전에 나지 못함 한탄 했지.
-니원(泥洹)은 열반과 뜻이 같다.(泥洹涅槃義同.)
從來未能洗茶愛 이제껏 차 사랑을 능히 씻지 못하여서
持歸東土笑自隘 우리 땅에 가져오니 속좁음을 웃어 본다.
錦纏玉壜解斜封 옥그릇에 비단 두른 빗긴 봉함 풀어서
先向知己修檀稅 지기(知己)에게 먼저 보내 단세(檀稅)를 바치구려.
예전부터 성현들은 모두 차를 사랑했다는 말로 서두를 열었다.
차의 성품은 군자와도 같아서 삿된 기운이 하나도 없다. 이어지는 차의 연원에 대한 설명이 묘하다.
작품에는 「동다송」과 마찬가지로, 중간중간에 협주를 달았다. 협주는 모두 5개다.
『서역기(西域記)』와 『다서』, 『대반야경(大般若經)』을 인용했고,
『다서』를 제외한 나머지 넷은 모두 불경에서 끌어왔다.
차의 근원에 대한 설명도 특이하다. 인간 세상에서 나는 풀잎 차를 대개 맛 본 뒤에 설령(雪嶺),
즉 히말라야로 들어가서 노아차(露芽茶)를 따와 제품으로 만든 것이 차의 시원이라고 했다.
수품(水品) 또한 황하의 발원지인 아욕달지(阿褥達池)에서 나는 가볍고 맑고 차고 부드러우며, 아름답고 냄새 없고,
마실 때 알맞고 마신 뒤에 뒤탈이 없는 여덟 가지 덕을 갖춘 경연수(輕軟水)를 길어서 이 물로 차를 끓였다.
그러자 차의 체(體)와 신(神)이 환하게 열려, 나쁜 기운은 말끔히 사라지고 정기(精氣)가 스며들어, 청정한 정신으로
득도의 경지에까지 가볍게 오를 수 있었다. 그래서 이 차를 영산(靈山)으로 지녀와 부처님께 바치기 시작했다.
또 점다법(點茶法)을 더욱 발전시켜 범률(梵律), 즉 부처님의 율법처럼 정밀하게 체계를 갖추니
차의 진체(眞體)가 묘원(妙源)을 다하게 되어 바라밀의 대법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말하자면 초의는 이 시에서 차의 연원을 신농씨의 『식경(食經)』에서 찾는 전통적인 설명법과 달리 불경에 근거하여
차의 불교 시원설을 펼치고 있는 셈이다. 차가 범어로는 알가화(閼加花)라 한다든지, 부처님 열반 전에 태어나지 못함을
안타까워 했다든지 하는 언급은 차가 부처님 시대부터 이미 세상에 행해져서 득도(得道)의 한 방편으로 사랑을 받았음을
밝힌 대단히 흥미로운 내용이다. 근거로 삼은 문헌은 당나라 현장 스님의 『대당서역기(大唐西域記)』인 듯 한데,
이에 관해서는 앞으로 좀더 정밀한 논의가 필요하다.
초의는 자신이 부처님보다 3천년이나 뒤늦게 태어나, 당시의 다도를 물을 길이 없고, 그 방법도 알 수가 없게 되었음을
안타까워 했다. 그런데 여태까지도 차를 사랑하는 습벽만은 씻어낼 수가 없어, 이 차가 우리나라 땅에까지 전해져 널리
퍼지고 있으니, 차에 대한 그 맹목적인 집착을 웃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마지막 두 구절에서는 산천이 말한 옥그릇에
비단으로 감싸둔 비싼 중국차를 혼자만 마시지 말고, 단세(檀稅) 즉 부처님 전에 바치는 세금 삼아
자신에게도 좀 보내 보라고 말한 것이다.
이상 초의와 산천 김명희의 교유를 살펴보고, 산천이 초의에게 보낸 「사차」시와 이에 대한 초의의 답시를 읽어 보았다.
두 작품은 모두 차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펼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초의의 답시는 차의 불교 시원설을
과감하게 제창한 내용으로, 문헌 근거를 비롯하여 향후 차계의 더 꼼꼼한 연구가 요청된다.
조선 후기 차문화사의 모든 중심에는 이렇듯 늘 초의가 존재했다.
여기에 그의 스승인 다산과 벗인 추사 형제 등이 포진하여,
차문화의 힘찬 고동을 알렸다.
정학연의 차 편지와 호의縞衣의 장춘차長春茶
유산(酉山) 정학연(丁學淵, 1783-1859)과 운포(耘逋) 정학유(丁學游, 1786-1855)는 다산 정약용의 아들이다.
형제는 아버지 다산의 강진 유배지를 몇 차례 왕래했고, 이후 아버지의 제자 및 대둔사의 승려들과 지속적인 교유를 나누었다.
이들은 아버지 다산을 이어 차에 일가견을 지녔던 차인이었다.
『일지암시고(一枝庵詩稿)』에는 형제가 초의 스님에게 보낸 시가 여러 편 실려 있다.
근자에 영인된 정학연의 시집 『삼창관집(三倉館集)』과 『종축회통(種畜會通)』에도 차시 및 차와 관련된 항목이 있다.
필자가 최근 확인한 영남대학교 동빈문고 소장 『유산일문기대둔사제선사간찰첩(酉山一門寄大芚寺諸禪師簡札帖)』
(이하 『유산일문첩』)과 일산 원각사 소장 『다암서첩(茶菴書帖)』은 다산의 아들과 손자들이 호의(縞衣)와
안익(安益), 각안(覺岸) 등 대둔사의 승려에게 보낸 친필 편지들을 합첩한 서첩이다.
여기에도 차와 관련된 내용이 매우 많아 지금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정학연 형제를 위시한 다산 후손들의 차생활에 대해 많은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밖에 고 예용해 선생 소장 간찰 한편이 따로 전한다. 이 글에서는 먼저 정학연의 차시와 차 편지를 소개하겠다.
정학연의 차시와 차 관련 기록
정학연의 시집 『삼창관집』필사본 1책은 일본 궁내청 서릉부(書陵部) 소장 자료로
1802년부터 1808년까지 7년간의 작품을 연도별로 수록했다.
정학연의 나이 20세 때부터 26세까지의 작품 모음이다.
이 중 23세 때인 1805년 봄에 지은 시 가운데 차에 관한 내용이 처음 나온다.
「서회(書懷)」란 작품이다.
世棄書猶著 세상이 버려도 저술은 하고
家貧酒亦賒 집 가난해 술조차 외상을 하네.
晩雲凝埭樹 늦은 구름 방죽 나무 걸리어 있고
春雨沒堤沙 봄비에 제방 모래 잠기었구나.
江市賤粳米 강가 저자 멥쌀은 값도 헐하여
山房開茗芽 산방에서 차싹 봉지 열어본다네.
鄕居恰六載 시골 살이 6년간 흡족도 하니
幽事足堪誇 그윽한 일 자랑하기 충분하구나.
세상에서 버림을 받았지만 저술에 힘쓰고, 집안 살림은 궁색해서 외상 술을 먹는다고 했다.
6구에 산방에서 ‘명아(茗芽)’를 열어본다 하여, 차싹을 따로 보관해두고 차를 달여 마신 일을 적었다.
바로 이어지는 시가 「전다(煎茶)」인데, 여기에는 매우 구체적인 차생활에 대한 언급이 보인다.
卯酲仍帶午眠遲 간밤 숙취 깨질 않아 낮잠이 늘어지다
石炭微烘蟹眼奇 석탄 살짝 지피니 해안(蟹眼)이 기이하다.
水味堪羞惠山澗 물 맛은 혜산천(惠山泉)에 부끄럽다 할만 하나
木癭不讓越州瓷 목영(木癭)은 월주자(越州瓷)만 못하지 않다네.
賸澆司馬相如渴 사마상여 갈증이야 적셔주기 너끈해도
難求東方曼倩飢 동방만청 굶주림은 구하기가 어려워라.
喫菜枯腸何用飮 채식 하던 마른 장에 어이 차를 마시랴만
閒中聊作澹生涯 한가한 중 담박한 생애를 지어보네.
숙취를 깨려고 찻물을 달인다고 했다. 물맛이야 천하 제일 혜산천에 견줄 수가 없겠지만,
나무 둥치를 돌려깎아 만든 찻잔만큼은 월주 땅의 흙으로 구운 자기만 못지 않다고 했다.
차가 갈증을 적셔줘도, 굶주림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한 것은 재미난 표현이다.
자신은 늘 채식을 하는 처지라 기름기를 제거하는 효능을 지닌 차를 마시는 것이 적절치가 않지만,
담박한 생활 속의 한가로운 정취를 즐기기 위해 이렇게 차를 마시노라고 적었다.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다산이 21세 나던 임인년(1782)
봄에 지은 「춘일체천잡시(春日棣泉雜詩)」에 백아곡에서 난 새 차를 얻은 뒤 지은 시가 있고,
「미천가(尾泉歌)」에도 용단차를 마셔 고질병을 다스린다는 내용이 있었던 것을 기억한다면,
정학연 또한 아버지를 이어 어려서부터 차에 익숙해 있었음이 분명하다.
석탄을 지펴 찻물을 끓이는 절차뿐 아니라, 갈증을 적셔주고 기름기를 제거하는 차의 효능에 대해서도 숙지하고 있었다.
3년 뒤인 1808년에 지은 「다관(茶罐)」이란 작품도 있다.
去覓燕京市 연경의 저자를 가서 뒤져서
來供牛渚堂 소내 물가 집으로 선물하였네.
松煤頻上面 솔 그을음 여러 번 뒤집어 쓰매
石髓好充腸 석수(石髓)를 마시기에 아주 좋구나.
臨卷沾餘滴 책 보며 남은 물로 적시어주면
依爐放暗香 화로에서 은은한 향기가 나지.
爲余淸口吻 날 위해 입 속을 맑게 헹구니
終不避流湯 마침내 유탕함도 피하지 않네.
누군가 그의 차에 대한 기호를 알아, 연경에서 구해온 다관을 선물했던 모양이다.
솔 그을음이 자주 묻는다고 한 3구와 석수(石髓)로 장을 채운다는 4구는 자신이 차를 평소에 즐겨 자주 끓여 마신다는
뜻으로 한 말이다. 또 책을 보다가 남은 물을 다관에 부어 화로에 올라오는 은은한 향기를 음미하고,
이것으로 입을 맑게 헹구었다. 남들이 이러한 호사를 두고 유탕(流蕩)하다고 나무란다 해도 개의치 않겠다는 뜻을 비쳤다.
그의 차생활은 이때 이미 생활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이밖에 비교적 만년의 시를 수록한 고려대 소장 필사본 『순리어필집(蒓里魚疋集)』에도
「호옥전다(湖屋煎茶)」시 3수가 실려 있다. 제 1수 1,2구에 “한 심지 향 사르며 차를 더디 달이니,
연실인양 정화(情話)가 새록새록 피어나네.(燒香一炷煎茶遲, 情話抽新似藕絲)”라고 했다.
『종축회통(種畜會通)』은 정학연의 농업 및 축산 관련 저술이다. 필사본 8권 3책으로,
현재 일본의 개인이 소장한 유일본이다. 이 가운데 제 3책 권 5에 「차」항목을 따로 마련했다.
자료 제공을 겸해 여기에 소개한다.
『사시유요(四時類要)』에 말했다.
“익었을 때 거두어 열매를 취해, 젖은 모래 흙에 섞어 대광주리에 휘저어 담는다.
볏짚이나 풀로 덮어주지 않으면 바로 얼어 싹이 나오지 않고, 2월 중에야 나온다.
이를 나무 아래나 북쪽 그늘진 땅에 심는데, 둥글게 석 자의 구덩이를 파되 깊이는 한 자로 해서, 잘 쪼개서
인분과 흙을 붙여 매 구덩이마다 6,70개의 씨를 심는다.
대개 흙은 한 치 남짓 두텁게 덮어주고, 풀이 멋대로 나게 내버려두어 김매지 않는다.
서로 거리는 두 자로 하고 한 방향으로 심는다. 가물 때는 쌀 뜨물을 준다.
이 물건은 햇빛을 두려워하므로 뽕나무 밑이나 대나무 그늘에 심으면 다 좋다.
2년 뒤에야 바야흐로 김을 매서 손볼 수 있다. 오줌이나 묽은 똥, 누에 똥을 거름으로 주어 북돋우되
지나치게 많아서는 안 되니, 뿌리가 약해질까 염려해서다. 대개 산중에 비탈진 곳이 좋고,
만약 평지라면 양쪽 두둑에 깊게 이랑을 파서 물이 빠지게 해야 한다.
물이 스미면 뿌리는 반드시 죽고 만다. 3년 뒤에 차를 거둔다.”
○ 『화경(花鏡)』에 말했다. “차를 보관할 때는 반드시 주석으로 만든 병을 써야 한다.
그러면 차의 빛깔과 향이 비록 해를 넘겨도 전과 같다.”
○ 현호선생(玄扈先生)이 말했다.
“거두어 간수하는 것은 반드시 대 그릇에 자른 대껍질을 섞어서 저장하면 오래 되어도 눅지 않는다.”
세 대목의 인용으로 이루어졌다.
『사시유요(四時類要)』는 한악(韓鄂)의『사시찬요(四時纂要)』를 말한다.
차씨를 받아 발아시킨 후, 땅에다 옮겨 심는 절차와 거름주는 법, 재배 상의 주의 사항 등을 적은 내용이다.
그리고 차의 보관에 대해 쓴 『화경(花鏡)』과 현호선생의 글 한 단락 씩을 인용했다.
현호선생은 서광계(徐光啓, 1562-1633)를 가리키니, 인용은 그의 『농정전서(農政全書)』에서 따왔다.
정학연의 차에 대한 공부는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었다.
이들 시와 위 인용은 아버지 다산이 유배 가기 전부터 다산 집안에서 차를 즐기고,
관련 서적을 두루 섭렵하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또 이는 다산의 차생활이 유배 이전부터 시작된 것이었음을 말해주는 자료이기도 하다.
차를 보관하는 중국의 주석병
호의의 장춘차
호의(縞衣) 시오(始悟, 1778-1868) 스님은 초의와 함께 완호(玩虎) 윤우(倫佑, 1758-1826)의 법맥을 이은 대둔사의 승려다.
동복 적벽 사람으로 속성이 정씨(丁氏)였다. 다산은 그가 한 집안이라 하여 특별히 아끼는 뜻을 담아 호게(號偈)와 서문을
써주기까지 했다. 호의가 초의와 마찬가지로 제다(製茶)에 깊은 조예를 지녔고, 그의 차가 서울까지 올라온 사정은 지금까지
알려진 바 없다. 금번에 소개하는 정학연이 호의에게 보낸 11통의 편지는 호의차의 구체적 내용을 증언한다.
이중 먼저 소개할 것은 고 예용해 선생 소장의 간찰 1통이다.
지금 세상에서 차의 지기(知己)는 두실(斗室) 태사(太史) 뿐입니다.
두실 태사께서 나를 통해 장춘차(長春茶) 몇 사발을 마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내가 어려서부터 중국의 이름난 차를 두루 맛보았네.
차의 품질을 품평하는 것은 스스로도 나만한 이가 없으리라 여기지.
무슨 놈의 기막힌 차가 저 먼 고장에서 생산되어 이제야 비로소 이름이 드러난단 말인가.
절강(浙江)과 나개(羅岕)와 동갱(銅坑)은 진품이 제법 많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맛보기가 힘들다네.
질 나쁜 중국차를 마시느니, 차라리 장춘차를 취하겠네 그려.”
이 말이 몹시 좋아 스님을 위해 외워드립니다. 내년 곡우 때는 능히 유념해 주실 수 있을런지요.
괜시리 산인(山人)께 한바탕 번뇌만 안겨드릴까 염려됩니다.
작년 꽃 필 적에 초의(艸衣) 스님과 더불어 함께 임청정(臨淸亭) 아래 앉아 해묵은 소나무 사이에서
술항아리와 붓 벼루로 온종일 읊조리려 하였는데, 세속 일이 연실[藕絲]처럼 끊이질 않아,
마침내 뜻과 어긋나 꽃 시절을 헛되이 보내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안타깝습니다.
이제 이때가 다시 돌아왔으니 모두 환세(幻世)의 기이한 인연입니다. 16일이 마침 가까웠으니
한 잎 고깃배로 사라담(䤬鑼潭) 위로 거슬러 올라가 지난 봄 마치지 못한 빚을 보상받을까 합니다.
다만 열흘 밖에 남지 않아 또 능히 함께 할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대사와 함께 하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며 이를 글로 알려드립니다.
7월 4일 학가(學稼) 돈수
정학연이 보낸 발신자와 발신 연대가 분명치 않은 편지다. 서명을 ‘가(稼)’라고 했으니, 학연으로 개명하기 전
학가(學稼)란 이름을 쓰던 젊은 시절의 편지다. 『유산일문첩』 제 6신도 학가로 서명이 되었는데,
1819년 7월 4일자의 서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 비슷한 시기에 쓴 것인 듯 하다. 수신자의 이름도 분명치 않다.
다만 호의와 관련된 다산의 편지가 합첩되어 있고, 초의와 나란히 거론된 것으로 보아
수신자는 호의였을 것으로 본다. 이때 다산은 귀양에서 풀려나 두릉에 있을 때였다.
정학연이 초의에게 보낸 차에 관한 편지.
편지에서 정학연은 자신의 차 지기(知己)로 두실(斗室) 태사를 꼽았다.
두실은 심상규(沈象奎, 1766-1836)의 호다. 영의정까지 지낸 당대의 거물이었다
. 그는 자신의 집인 가성각(嘉聲閣)에 무려 4만권의 장서와 온갖 기이한 물건을 갖춰두고 호사를 누렸던 인물이다.
진귀한 중국차도 산지별로 다 구해 맛보았다.
그는 스스로 차맛의 감별에 관한 한 자기만한 사람이 없으리라고 자부했던 모양이다.
그런 그가 정학연이 끓여준 장춘차 몇 사발을 마셔보고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도대체 어디서 이런 기막힌 차를 구했느냐고 물었다.
정말 좋은 중국차는 구하기가 어렵고, 값만 비싼 저질품은 마실 수가 없으니,
엉터리 가짜 중국차를 마시느니 차라리 장춘차가 훨씬 낫겠다고 품평했다.
정학연은 심상규의 이 칭찬을 전하면서
슬쩍 내년 곡우 때에는 그를 위해서도 따로 차를 마련해 줄 수 있겠느냐고 부탁했다.
워낙에 차가 귀할 때였던지라 이렇게 억지를 부리지 않고는 차를 입에 대어볼 수도 없었다.
정학연은 호의의 차에 장춘차(長春茶)란 이름을 붙여주었다. 장춘동(長春洞)은 해남 대둔사의 골짜기이니
장춘차는 해남 대둔사에서 만든 차란 뜻이다. 이로써 우리는 차문화사의 뜻 깊은 이름 하나를 확인하게 되는 셈이다.
그리고는 화제를 바꿔, 작년 봄, 초의 스님과 초천 가에 있던
임청정(臨淸亭)에서 시회(詩會)를 열며 봄꽃 구경을 하려 했는데
이루지 못한 애석함을 적었다. 또 집 앞의 사라담에 일엽편주를 띄워놓고
7월 16일 소동파의 「적벽부」 뱃놀이를 본떠 지난 해의 유감 풀이나 하려한다는 사연을 적었다.
편지를 보내는 날이 이미 7월 4일이어서 대둔사에서 이날까지 대어오기는 늦은 때였으므로,
함께 하지 못해 유감이란 말로 편지를 맺었다.
위 편지는 몇 가지 사실을 증언한다.
첫째, 그간 차에 있어서는 초의의 존재만 알려져 있었으나, 호의 또한 따로 차를 만들어 두릉으로 보내고 있었다.
둘째, 해남 대흥사에서 만든 차를 장춘차(長春茶)라고 불렀다.
셋째, 중국차를 두루 맛보아 차에 대한 안목이 높았던 심상규가 칭찬을 아끼지 않았을만큼 차맛이 훌륭했다.
『유산일문첩』제3신. 영남대 도서관 소장
정학연의 차 청하는 편지
이제 『유산일문첩』에 수록된 차 관련 편지를 차례대로 검토하겠다.
지면의 제약으로 다 읽지는 못하고 차와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유산일문첩』 제 3신이다.
초의가 이곳에 있는 덕분에 연달아 글을 받자오니, 매번 사람의 마음을 상쾌하게 합니다.
다만 서폭 가득 서로 그리며 연면히 애틋한 정의 말씀이 넘쳐 흘러, 저로 하여금 더더욱 아득히 마음이 녹아들게 합니다.
초가을에 선정(禪定)이 맛나고, 지체도 청건(淸健)하심을 알게 되어 몹시 기쁩니다.
저는 양친의 병환이 봄 여름을 지나 가을까지 이어지고, 제 묵은 병도 또 이와 같은지라,
눈썹을 펴고 입을 열 날이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스스로 연민할 따름이지요.
글씨첩은 만약 제가 한가로이 지내며 즐거운 일이 많을 것 같으면,
팔꿈치를 시험해 글씨를 쓰는 것이 어찌 이 정도에 그쳤겠습니까?
다만 이처럼 근심으로 골몰하여 잠깐의 틈조차 탈 수가 없으니 어찌하겠습니까?
단지 한 폭의 싯귀와 몇 조각의 벽에 붙일 글씨를 받들어 부칩니다.
이로써 천리의 면목을 대신할 뿐이니 글씨라고야 하겠습니까?
연적 하나를 함께 보냅니다. 한번 따를 때마다 저를 한 차례 생각해 주십시오.
부쳐주신 차는 참으로 기이한 선물이니, 사양하지 않으렵니다.
뒷 인편에 또한 이같은 갈망을 생각하셔서 더 낫게 보내주시면 몹시 다행이겠습니다.
연거푸 보내 주실 수 없다면 만에 하나라도 남겨 주십시오. 이만 줄입니다.
신미년(1831) 8월 6일, 학연 삼가.
『유산일문첩』제10신.
1831년 8월 6일에 호의에게 보낸 편지다.
이때 초의는 스승 완호의 탑명을 받는 일로 해를 넘겨 정학연의 집에 머물며, 장안의 명류들과 시회를 여는 등
명성을 드날리고 있었다. 초의의 체류가 예상 외로 길어지자, 호의가 연거푸 편지를 보냈던 모양이다.
편지의 내용이 참 정스럽다. 호의는 정학연에게 글씨를 요청했고, 정학연은 넉넉히 써보내지 못하는 것을 미안해 했다.
편지의 주된 용건은 기이한 차 선물을 보내주어 고맙다는 말과 다음번에는 훨씬 더 많이 보내주면 감사하겠다는
부탁에 놓여 있다. 앞서 본 편지와는 10년 가량의 시간적 거리가 있다.
호의는 그후로도 줄곧 정학연에게 차를 만들어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은 『유산일문첩』 제 10신이다.
가을 들어 범리(梵履)는 청안하신지요. 찬 산에 잎은 지고 종소리와 등불 그림자에 꿈을 깨어 일어나면,
대공(臺公)의 축지법을 배워 한 달음에 스님을 찾아보지 못함이 안타깝습니다. 저는 쇠약한 형상이 날로 심해져서,
이번 여름에 겪은 것을 말하려니 지금도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다행이 가을바람이 불어옴에 힘입어 겨우 예전처럼
움직이고는 있지만, 자고 먹는 것이 남만 못합니다. 다만 방안 사이에 뒹구는 물건이 되었을 뿐입니다. 시 한 수를
받들어 보이니 뜻에 맞으실런지요. 보통의 차는 요동의 돼지일 뿐이니, 반드시 초의와 대사께서 손수 만든 것이라야
훌륭합니다. 큰 차포(茶包) 하나를 목헌(牧軒) 서아사(徐雅士) 편에 부쳐 주시면 어떠실런지요.
서아사가 또한 마땅히 장춘동에 들리게 되면 반드시 스님을 찾아갈 것입니다.
차를 맡기는 부탁은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겝니다. 인편이 기다리고 있어 이만 줄이옵고 다 적지 못합니다.
살펴보소서. 신축년(1841) 8월 20일, 종말(宗末) 정학연 돈수.
앞서의 편지에서 다시 10년 뒤인 1841년의 편지다. 이때 정학연은 61세였다.
수신자를 “호의선사(縞衣禪師) 정탑(定榻)”이라고 적었다. 자신이 지난 여름에 건강을 잃어 심하게 앓았던 일을 말했다.
요동시(遼東豕)는 고사가 있다.
요동 사람이 기르던 돼지가 머리가 흰 새끼를 낳자, 신기하게 생각해서 임금에게 바치기 위해 하동 땅으로 갔는데,
그곳의 돼지를 보니 모두 흰지라 부끄러워 그저 돌아왔다는 이야기다. 여기서는 보잘 것 없다는 뜻으로 썼다.
보통의 차는 별 볼일이 없고, 초의나 호의가 직접 만든 수제차라야 맛이 훌륭하다고 하면서,
내려가는 인편에 직접 만든 장춘차를 큰 포로 하나 보내줄 것을 부탁했다.
『유산일문첩』제12신.
다음은 제 10신에서 함께 부친 시다.
一夢尋僧紅葉家 하루밤 꿈 홍엽가(紅葉家)로 스님 찾아 갔더니
松風澗水趙州茶 솔바람 시냇물에 조주차(趙州茶)를 내오시네.
玉泉寺裏仙人掌 옥천사 안에는 선인장 차 난다 하니
腸斷中孚碧玉花 중부(中孚)의 벽옥화가 애를 끊게 하는구려.
청련 이태백의 집안 승려인 중부선사가 옥천사에서 찻잎을 땄는데 벽옥과 같았다.
맑은 향기가 매끄럽고도 부드러워 다른 것과는 달랐다.
중부가 수십 포를 이백에게 부치니 인하여 선인장차라고 이름 지었다.
중부는 금릉에 살았으므로, 이백과 늘상 왕래하였다.
시 바로 다음에는 「호의 스님 선감(禪鑒)에 읊어 드리며 인하여 차포(茶包)를 청하다.
(吟呈縞衣開士禪鑒, 仍乞茶包.)」란 제목을 달았다.
그리고는 따로 중부선사의 선인장차 고사를 친절하게 부기하였다.
꿈 속에도 차가 그리워 단풍잎 붉게 물든 절집으로 찾아갔다.
스님은 냇물을 길어와 조주차(趙州茶)를 끓여 내온다.
3,4구는 옥천사에 난다는 중부선사(中孚禪師)의 선인장차(仙人掌茶) 생각이 간절하니,
여유가 있으면 조금 나눠달라는 뜻을 적었다.
『유산일문첩』제13신.
이어지는 내용은
이백의 「족질 중부(中孚)가 옥천산의 선인장차를 준 데 답례하여(答族侄中孚贈玉泉仙人掌茶)」란
시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초의의 자(字)인 중부(中孚) 또한 바로 중부선사에게서 따온 것임은 앞서도 지적한 바 있다.
중부는 금릉(金陵)에 살았는데, 다산의 유배지였던 강진의 다른 이름 또한 금릉이어서 차를 통한 인연이 묘하게 이어졌다.
정학연은 집안 승려인 호의를 중부선사에 견주고 자신을 이백에 비겨, 중부가 이백에게 선인장차 수십 포를 부쳐주었듯이
자신에게도 장춘차를 넉넉히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다음은 위의 요청에 따라 이듬해인 1842년 1월 12일에 호의가 차를 부쳐오자,
기쁨을 이기지 못해 보낸 답신이다.
청나라 김정표(金廷標)의 「품천도(品泉圖)」. 대만 국립박물원 소장.
거울에 제 얼굴을 비춰보니 쇠약하고 하얗게 센 것이 이와 같은지라,
노사께서 비록 십사(十使: 인간의 마음을 제멋대로 부리는 열가지 번뇌)에 시달림이야 없다 해도,
연세가 절로 높아 이 장벽에 편안하게 대처하여 능히 지난날 마주하던 모습과 같을 수는 없으리라는 것을 미루어 알겠습니다.
이 세상은 몹시도 짧고, 둘 다 모두 이리 늙고 말았군요. 얼굴을 볼 방법이 없어 다만 천정을 우러러 혀를 찰 뿐입니다.
편지를 받아보매 해를 넘겨서 온 것인데, 날짜를 헤아려 보니 겨우 30일밖에 되질 않아 몹시 기뻤습니다. 새해에 법리는
청안하시겠지요. 남녘 구름을 따라가다 보면 다만 맺힌 그리움만 더할 뿐입니다.
부쳐주신 좋은 차를 직접 봉함을 끄르니 정성이 담뿍 담겨 있어서, 샘물을 길어 끓이기도 전에
이미 마음의 향기가 차포(茶包)에 스며드는 것을 느끼겠습니다. 마땅히 진주처럼 아껴서 봄철을 지내는 밑천으로 삼으렵니다.
다만 차에 고질 든 것이 이미 고황(膏肓)까지 들어 마치 홍로(洪爐)나 묵뢰(黙雷)인양 한정이 없는지라,
이것이 염치 없습니다. 서아(徐雅)가 비록 서울로 돌아왔지만, 이 목관(牧官)은 아직 체직되지 않아
차와 편지를 전하는 것은 염려가 없습니다. 다만 노사께서 번번이 이어 보내주실 수 없음을 안타까워할 뿐입니다.
저는 노병이 점점 심해져서 형제가 서로 마주하여 구슬피 상심하며 좋은 마음이라곤 아예 없으니 어찌한단 말입니까?
정성을 펼 물건이 없어 더더욱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다만 초의가 올라오기를 기다리지만 어찌 바랄 수 있겠습니까.
붓을 들고 마음만 내달립니다. 다 갖추지 못합니다. 임인년(1842) 1월 12일 종인(宗人) 학연 돈수.
지난 해 8월 차 부탁을 받고 호의는 연말 인편에 차와 편지를 올려 보냈다.
이것이 해를 넘겨 1월 12일에 도착한 것이다. 두근거리며 차 봉함을 열자 훅 끼쳐오는 차향에 찻물을 끓이기도 전에
마음이 푸근해졌다. 봄 내내 진주처럼 아껴 마시겠노란 말이 조금도 과장으로 들리지 않는다.
그러면서 자신은 차감(茶疳), 즉 차벽(茶癖)이 이미 고질이 되어 아무리 많은 양의 차라도 성에 차지 않으니,
염치없지만 가능하다면 다른 인편에 계속해서 더 부쳐주면 좋겠다는 부탁으로 편지를 맺었다.
인편을 구하지 못한다면 결국 초의가 서울로 올라오기를 기다릴 수 밖에 없는데,
이 또한 어찌 바랄 수 있겠느냐며 편지를 맺었다.
1843년 6월 13일의 편지에도 차 이야기가 나온다.
“이제 문득 어렵사리 도착한 편지와 함께 보내주신 두강차(頭綱茶)의 맑은 맛은 만다라의 보액(寶液)입니다.
천리 길에 보내주심은 실로 노사의 심력이 먼데까지 미치신 덕분이니,
그 감사함을 헤아릴 길 없어 더더욱 깊이 흠탄합니다." 라고 하였다.
이밖에도 이들 편지는 정학연과 호의 사이에 오간 여러 곡진한 사연들을 담고 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글로 살펴보기로 한다.
호의 외에 초의와의 사이에도 더 많은 편지가 있었을 것이나,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없다.
『일지암시고(一枝庵詩稿)』에 정학연이 초의에게 차를 받고서 보낸 「사차시(謝茶詩)」와
이에 대한 초의의 답시가 실려 있는 것으로 보아, 초의가 만든 차 또한 부지런히 해남과 두릉 사이를 오갔을 것이다.
정학유의 차 편지와 두륜진차頭輪眞茶
다산 집안에서 대둔사 승려에게 보낸 편지첩에는 맏아들 정학연뿐 아니라,
다산의 둘째 아들인 정학유의 차 편지도 적지 않게 들어 있다.
그 또한 차를 아끼고 애호했던 차인이었다. 그가 남긴 차시와 차 편지를 차례로 읽어 본다.
정학유의 차시와 초의의 화답시
문집이 일부나마 전하는 정학연과 달리 동생 정학유의 시문집은 현재 따로 전하지 않아, 그의 차시는 남은 것이 없다.
다만 초의의 『일지암시고(一枝庵詩稿)』에 초의에게 보낸 「차시(茶詩)」 한 수와 초의가 이에 화답한
「봉답운포차시(奉答耘逋茶詩)」가 함께 실려 있다. 제목은 차시라고 했지만 차와 직접 관련된 내용은 없다.
하지만 일지암의 주변 풍경과 초의의 일상이 잘 그려져 있어 자료 제시 겸해서 읽어보겠다.
운포(耘逋)는 정학유의 호다.
다음은 정학유가 서울로 부쳐온 초의의 차를 받고 감사의 뜻을 담아 보낸 시다.
艸衣老禪不緶草 초의 스님 정작 풀은 가꾸지 않으시고
手種靑竹萬竿好 손수 청죽 심으시니 만 그루가 어여쁘다.
竹香室中見日遲 죽향실 안에서는 해를 봄도 더디겠고
金剛巖畔迎風早 금강암 기슭에선 바람 맞이 이르겠네.
自從趺坐頻出難 가부좌 하고부터 잦은 출입 어려워
只得池塘十步看 다만 겨우 연못 가를 열 걸음쯤 보신다네.
魚鼓纔沈半牀月 목어 소리 잦아들면 침상 절반 달빛 들고
滴露淸宵鳴未歇 이슬 듣는 맑은 밤엔 풍경 소리 끊이잖네.
靑鸞何日下香臺 푸른 난새 언제나 향대(香臺)로 내려오리
赤霞南溟一道開 남쪽 바다 붉은 노을 한 길이 열렸구나.
無風自動君知否 바람 없이 절로 떨림 그대는 아시는가
夢裏漁簔曾拂來 꿈 속에서 도롱이 옷 떨쳐입고 오시누나.ᅠ
시는 『일지암시고』에 따르면 1848년에 지은 것이다.
대둔산 금강암(金剛巖) 기슭에 자리잡은 초의의 일지암 풍경과 초의 스님의 하루 일과를 그려본 내용이다.
초의는 1830년에 일지암을 짓고, 1833년에는 둘레에 대나무를 옮겨 심었다.
그 경과는 「종죽(種竹)」이란 장편시에 적혀 있다.
둘레가 온통 대밭이었으므로 일지암의 거처를 죽향실(竹香室)로 부른 것을 3구에서 알 수 있다.
5구는 초의가 제주도 유배지로 추사를 만나러 갔다가 낙마 사고로 다리 뼈가 부러진 사고를 당한 일을 말한 것이다.
당시 초의는 목발을 짚고 겨우 일지암 앞 연못가를 몇 발짝 둘러볼 정도의 상태였던 모양이다.
저녁 무렵 큰절에서 목어와 법고 소리가 잠잠해지면 달빛은 어느새 거처하는 방의 절반 쯤 스며들고,
맑은 밤중에도 처마 끝의 풍경소리는 쉼없이 쟁그랑대며 잠든 정신을 일깨운다.
언제나 회복해서 푸른 난새 같은 스님이 서울 걸음을 하실 수 있으시려나 하며 시상을 마무리했다.
다음은 위 시를 받고 초의가 보낸 답시 두 수다. 제목은 「운포의 차시에 삼가 답하다(奉答耘逋茶詩)」」이다.
百樣奇花千般艸 백 가지 기이한 꽃 천 가지 풀들은
朝艶暮萎不長好 아침 피어 저녁 지니 늘 곱지가 않다네.
爭似此君抱貞德 어이타 대나무가 곧은 덕성 품고서
不怨春晩淸霜早 늦은 봄 이른 서리 원망찮음 같겠는가.
移來不辭逾嶺難 옮겨올 젠 고개 넘는 어려움도 마다않고
曲爲主人愜幽看 곡진하게 주인 위해 그윽한 태 상쾌하다.
疎影孤伴池心月 홀로 성근 그림자는 못 속 달빛 벗을 삼고
弱條猶蘄鳳來歇 여린 가지 봉새 와서 깃들기를 기다리네.
夕陽漏紅滿涼臺 석양이라 번진 노을 찬 누대에 가득하여
炎瘴欲透無門開 무더위가 뚫으려도 문을 열지 않는다네.
無風搖綠玉磨響 바람 없이 잎 흔들자 옥을 가는 소리 나니
始覺乘鸞披拂來 난새 탄 이 옷깃 떨쳐 오는 줄을 알겠구나.
幽巖靜坐對碧艸 숨은 바위 가만 앉아 푸른 풀을 마주하며
終日凝然澹無好 멍하니 종일 봐도 담담히 별 일 없네.
雲端鶴師來相訪 구름 끝의 학(鶴) 스님이 나를 찾아 오셨는데
屨粘靑霞起行早 푸른 안개 신을 적셔 일찍 나선 줄을 아네.
忙手輕輕致不難 바쁜 손길 경쾌하게 어렵잖케 펼치니
促余開緘要共看 날 재촉해 함께 보려 봉함을 열게 하네.
中裹驪珠同明月 속에 싼 여룡 구슬 밝은 달빛 한 가지라
盈抱溢目光無歇 품에 가득 눈에 온통 광채가 끝이 없다.
千里相共照靈臺 천리길에 서로 함께 영대(靈臺)를 비추시니
一生懷抱細細開 일생의 회포가 하나하나 열리누나.
傷心最是難抑處 무엇보다 마음 상해 억누를 수 없는 것은
生前猶欠一往來 생전에 한 차례 더 왕래하지 못함일세.
이름은 초의(草衣)인데 어째서 풀은 안 심고 대만 잔뜩 심었냐는 장난의 말에, 풀꽃은 금방 시들지만 대나무는 변치 않기
때문이라고 대답하며 말문을 열었다. 일지암의 대나무는 원래 고개 넘어 적련암(赤蓮庵)에 있던 것을 옮겨온 것이었다.
제 10구를 보면 이 시를 쓴 때가 한 여름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수 3구에 나오는 학사(鶴師) 즉 학스님은 바로 호의(縞衣) 스님을 가리킨다.
학의 별칭이 호의현상(縞衣玄裳)이라서 이렇게 말한 것이다.
두릉에서 정학연 형제가 보낸 편지와 선물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호의가 이른 새벽에 산 위에서 일지암으로
초의를 찾아 내려왔던 모양이다. 선물 꾸러미를 열자, 호의는 어서 편지를 열어 보자고 재촉을 한다.
선물로 보낸 여룡의 구슬은 형제가 답례로 써준 글씨를 두고 하는 말인 듯하다.
일생의 회포가 하나하나 열린다 했으니, 자신과 나눈 그간의 우정을 시로 노래했던 것이다.
하지만 자신은 다리를 다쳐 이제 더는 서울 걸음을 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그들이 이곳까지 내려올 수도 없으니
그것이 상심이 될 뿐이라고 했다.
주고 받은 시는 시상의 아름다움이나 담긴 마음의 따뜻함도 훌륭하지만, 초의와 호의의 차를 받고서
정학유가 보낸 답시와 이에 대한 초의의 화답시란 점에서 차를 매개로 한 정 깊은 교유의 장면을 잘 보여준다.
정학연이 보낸 차시와 이에 대한 초의의 답시도 『일지암시고』에 실려 있으나 지면 관계로 소개하지 않는다.
『유산일문첩』제9신.
호의의 두륜진차(頭輪眞茶)
이제 정학유의 차 편지를 읽어보자.
앞서 소개했던 영남대학교 동빈문고 소장 『유산일문기대둔사제선사간찰첩(酉山一門寄大芚寺諸禪師簡札帖)』
(이하 『유산일문첩』)에 역시 호의(縞衣, 1778-1868)와 안익(安益)을 수신인으로 하는 정학유의 친필 편지 4통이 실려있고,
일산 원각사 소장 『다암서첩(茶菴書帖)』에 1통이 더 남아 있다. 5통의 편지를 차례로 살펴본다.
바다 산이 아득히 멀어 소식 듣기는 생각지 못해도 다만 미처 다 스러지지 않은 것이 옛 기억 속에 또렷합니다.
뜻하지 않게 초의가 와서 스님의 편지까지 얻게 되니 몹시 기뻤습니다. 근래 들어 더워지기 시작했는데, 산속 거처는
괜찮으신지요. 담은 마음이 오가도 저는 애틋함이 끊이지 않는데, 차마 의관을 갖추고 사람을 마주함이겠습니까?
일찍이 목석 같은 마음이 혼자서 슬퍼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는 것일 뿐입니다. 손수 만드신 좋은 차는 포장을 열자
이미 맑은 향기가 골수에 스며, 지난 십 수년의 해묵은 체증이 두륜진품(頭輪眞品)에 힘입어 열에 서넛은 물러나
버렸습니다. 이것을 얻은 뒤로 말할 수 없이 기뻐하니, 그 은혜 받음을 가늠할 만 합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초의는 산행에서 겨우 돌아오자마자 또 이같은 더위를 무릅쓰고 길에 오르므로,
작별하려니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병중에 힘들여 쓰느라 다른 말은 적지 못합니다.
무술년(1838) 윤달 24일, 병든 사람이 격식을 갖춰 감사드립니다.
도자기 차호(茶壺) 하나를 보냅니다.
1838년에 보낸 편지다. 이해에는 윤달이 4월에 들었다. 윤 4월 24일에 쓴 것이다.
이해 초의는 금강산 유람을 위해 서울 걸음을 했다가, 유람을 마치고 대둔사로 돌아올 때 앞서 받은 차에 대한 감사의 뜻을
편지에 담아 보낸 것이다. 호의차를 두륜진품(頭輪眞品)이라 부른 것이 흥미롭다. 두륜산에서 채취해서 만든 훌륭한 차란 의미다.
앞서 정학연은 장춘차(長春茶)라고 했었다. 병으로 누워 있다가 부쳐온 차의 포장을 끌르니, 고소한 차향이 골수에 스미는 듯하여,
묵은 체증이 열에 서넛은 벌써 간 곳이 없더라고 했다. 이때 정학유는 답례로 도자기로 구운 차호(茶壺)를 호의에게 선물했다.
『유산일문첩』제14신.
병으로 게을러 능히 글을 올리지 못했는데 편지로 먼저 문안을 주시니,
종이 위로 넘치는 정성에 단지 부끄럽고 송구함만 더할 뿐입니다.
삼가 섣달 추위에 법리(法履)가 평안하시고, 참선의 즐거움이 나이 들어 더욱 맛이 있는 줄을 알겠습니다.
기쁜 나머지 마치 다정한 말을 나누는 듯하였습니다. 저는 늙어 쇠약함이 더욱 심해져서 단지 형해만 남았을 뿐
다시 정신을 수습하지 못하고 지냅니다. 슬퍼하고 불쌍히 여길 것 같아 이에 대해서는 자세히 적지 않습니다.
부쳐주신 진차(珍茶)는 이 맛을 못 본지가 이미 1년이나 되었던지라 생각은 본시 법도대로 선미(仙味)를 찾으려 했으나,
헛되이 몽상만 수고로울 뿐이었습니다. 뜻밖에 정스런 편지로 온통 황홀하여 묵은 병이 문득 없어지니,
새겨 감사드려 마지 않습니다. 병 중에 힘들여서 어지러이 써서 보냅니다.
다만 바라기는 천(泉)을 위해 스스로를 아끼시지요. 이만 줄입니다.
임인년(1842) 1월 11일, 학유 돈수.
역시 호의가 보내준 차를 받고서 감사를 표한 내용이다. 1842년 1월 11일에 보낸 것이다.
두륜진차가 떨어진 지 1년이나 되어, 선미(仙味)는 몽상 속에서나 맛보려니 했는데, 갑작스레 차가 도착하니,
황홀한 마음에 해묵은 병이 벌써 저만이나 달아나고 말았다고 적었다. 차향이 글 밖으로까지 왈칵 끼쳐온다.
끝의 한 구절은 의미가 분명치 않다.
『유산일문첩』에는 호의 외에 안익(安益) 스님에게 보낸 편지도 4통이 실려 있다. 안익은 호의의 상좌였던 듯 한데,
현재 남아있는 승전(僧傳)에서는 어쩐 일인지 그의 존재를 찾아볼 수가 없다.
다음 편지는 정학유가 위 호의에게 편지를 보낸 것과 같은 날짜에 안익에게 보낸 글이다.
피봉에 ‘사익상인경창(謝益上人經窓)’이라고 써있는 것으로 보아,
역시 차를 보내준 안익 상인에게 답장으로 보낸 편지임을 알 수 있다.
아득한 바다 산을 향한 몽상이 더욱 괴롭던 차에 손수 쓰신 편지가 병들어 버려진 사람에게 도착하니,
이는 자비로움이 특별한 것입니다. 편지 보고 법리가 청적하시고 정진하심이 나날이 좋으심을 알 수 있어 먼 곳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됩니다. 제 병은 해마다 깊어져서 단지 비쩍 마른 고목의 몰골을 하고 방구들 사이에서 뒹굴고 있을 뿐입니다.
초의가 제주도로 가려던 것은 소원을 이루지 못했군요.
땅이 비록 하늘에 달린 것은 아니지만, 일 또한 사람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니, 이를 어찌하겠습니다.
몸의 병 중에 가장 괴로운 것은 기침입니다. 한창 심할 때는 두꺼비처럼 잠자려고 애쓰고,
게처럼 거품을 토하곤 하여, 마치 오랜 시간 꽉 막힌 듯함이 있습니다.
이때는 백약이 다 쓸모없고, 오직 두륜진차(頭輪眞茶) 일기(一旗)나 이기(二旗)를 입에 넣어 머금어 내려야만
비로소 가라앉습니다. 비록 병의 뿌리를 뽑을 묘한 약제는 아니나, 근심을 건져주는 훌륭한 처방은 될만 합니다.
앞뒤로 여러 스님께서 부쳐주신 것이 적지 않지만, 1년간 마시는 것이
몇 십근이 더 되니, 이것을 어찌 계속 보내줄 방법이 있겠습니까?
다만 이생에서 죽을 때가 다 되어 가까운 사람에게 수고를 끼치는 것도 또한 좋은 일은 아니겠지요.
올 봄 곡우 전에 딴 좋은 차를 반드시 이 병든 이를 위해 애써 주신다면 그 감사함이 마땅히 어떠하겠습니까?
초의도 함께 이 편지를 보십시오. 처음에는 각각 따로 쓰려 했지만 어지럽고 피곤해서 그리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만 쓰고 다른 말은 적지 않습니다. 임인년(1842) 1월 11일 학유 돈수.
당시 정학유는 천식을 심하게 앓고 있었던 듯하다. 두꺼비처럼 잠만 자려 하다가도, 기침이 나오기 시작하면 게거품을 문 것
같았다고 적었다. 이러할 때 특효약으로 정학유는 두륜진차(頭輪眞茶)를 꼽았다. 그것도 일양기(一兩旗), 즉 일창일기
(一槍一旗)와 일창이기(一槍二旗)로 만든 우전차를 달여 마셔야 다급하게 쏟아지던 기침이 겨우 가라앉는다고 했다.
앞뒤로 여러 스님이 부쳐준 차가 적지 않지만, 자신이 1년에 소비하는 차의 양이 수십근이 더 되므로, 이것을 계속
이어 대줄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고 적은 대목이 흥미롭다. 중국이나 강진 다신계 등 다른 경로로 얻은 차도 적지
않았을 것인데, 그렇다 치더라도 해남에서 두릉으로 올라온 차의 양은 결코 만만치가 않았다.
그러면서도 끝에 가서는 초의가 이 편지를 함께 읽어, 올봄 우전차를 다시 더 보내달라는
자신의 당부를 똑 같이 염두에 두어 줄 것을 부탁했다.
수제진품차의 효능
이듬해인 1843년 여름에도 정학유는 호의에게 편지를 보냈다.
당시 두 형제는 건강이 몹시 좋지 않아, 차의 힘에 의지하여 겨우겨우 지내던 형편이었다.
먼 곳 향해 달리는 생각이 늙어갈수록 더욱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글월을 받자오매 산거가 청적하시고 참선하는 재미가 기쁜 것을 알겠습니다.
마치 마주하여 다정한 말을 나눈 듯 마음이 놓입니다. 저는 쇠약함이 외려 심해졌고,
게다가 형님께서도 해를 넘겨 학질을 앓으셔서 육신과 정신이 다 나간 듯합니다.
들어앉아 약을 먹어봐도 효험이 없군요. 안타깝고 걱정스러움을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부쳐주신 좋은 차는 틀림없이 손수 만드신 정이 담긴 선물이로군요.
먼저 문 앞의 강물을 길어다가 시험 삼아 한 차례 끓였더니 문득 병든 목구멍이 시원스레 뚫리는 것을 느끼겠습니다.
천리 길에 감사를 어찌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바람결에 부치는 소식이라 마음을 다 펴기 어려워
다만 다음 인편을 기다릴 뿐입니다. 아픈 중에 어지럽게 씁니다. 이만 줄입니다.
계묘년(1843) 6월 14일, 종말(宗末) 학유 돈수.
1843년 6월 14일에 호의에게 부친 편지다. 차를 받자마자 갈급한 마음에 서둘러 앞 강물을 길어와 차를 끓여 마시는 광경이
눈에 선하다. 뿐만 아니라 병으로 답답하던 목구멍을 타고 차가 내려가자 시원스레 뻥 뚫리는 느낌이 있었다고 적었다.
이렇듯 정학유가 남긴 편지에는 모두 차를 보내 주어 감사하다는 말과 차의 효능에 대한 이야기가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유산일문첩』에는 1843년 6월 15일에 정학연의 아들 정대림(丁大林, 1807-?)이 호의와 안익에게 각각 보낸 편지가
두 통 따로 실려 있다. 이로 보아, 해남에서 부쳐온 두륜진차는 다산 집안으로 전해져서 분배되었고,
두 집안 모두 따로 편지를 써서 같은 인편에 답장을 보냈음을 알 수 있다.
정대림이 호의 스님께 부친 편지는 서두가 “매번 중부(中孚)의 선인장차 고사를 생각할 때마다 저도 몰래 기이하다고 외치며,
마음에 품어 두곤 합니다. 관편(官便)에 보내신 스님을 편지를 얻어 보니, 마치 선탑(禪榻)을 마주한 것만 같아 흔쾌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하물며 근래 지내심도 청적함을 알게 되니 더욱 마음이 놓입니다. 저는 노친께서 병환으로 열 달이나
위중하시다가, 겨우 수십 일 전부터 조금 나아지셨습니다. 하지만 잠자리와 식사의 절차는 잠시 평상을 회복치 못한 지라
초조하게 날을 보내느라 족히 소식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보내주신 차와 동백 기름은 전처럼 당상(堂上)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로 시작된다. 이백(李白)과 한 집안이었던 금릉의 중부(中孚) 스님이 옥천사의 선인장차를 이백에게 드렸던 것처럼,
다산과 한 집안인 호의가 강진의 별호인 금릉에서 차를 보내온 것이 너무나 똑 같아 기이하다고 말한 내용이다.

『다암서첩』에 실린 정학유가 호의에게 보낸 친필 편지.
끝으로 정학유가 호의에게 보낸 편지 한 통을 더 읽어 본다.
작년 여름 각안 스님이 돌아갈 때 일이 마치 어제 새벽 같은데, 잠깐 사이에 어느새 1년이 지났습니다.
어찌 애타게 그리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러던 차에 묘총(妙總)이 와서 보내신 편지를 받자와
봄철에 법리가 청적하심을 알게 되니 마음이 놓입니다. 마치 손을 맞잡고서 한 차례 얘기를 나눈 것만 같습니다.
생각해보니 두륜산 도량에서 온갖 꽃그늘에 새로 나온 죽순이 일제히 솟아날 제,
푸른 가죽신과 등나무 지팡이를 짚고서 만일암(挽日庵)과 북암(北庵) 사이를 왕래하던 것이 36년 전의 일입니다.
폐질이 생긴 듯하므로 서둘러 몸에서 떨어내야겠는데, 돌아보면 이루려고 바라던 바에 안주하고 말았으니
다만 스스로 한탄할 뿐입니다. 스스로 병증을 헤아려 보니, 마치 달리는 수레가 비탈을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방안에서도 걸음조차 뗄 수가 없어, 다만 겨우 숨만 붙어 있습니다.
보내주신 수제진품(手製珍品)이 여태도 끊어지지 않음에 힘입어, 이것으로 옥초(沃焦)의 감로수로 여깁니다.
초의가 정을 담아 보내준 것이 이제 또 잇달아 이르니,
두 분 스님이 나를 아껴주시는 마음이 아니었다면 어찌 여기까지 이르렀겠습니까?
글을 쓰려니 더더욱 망연할 뿐입니다. 팔 힘이 달려 다 적지 못합니다.
경술년(1850) 3월 24일, 종말 학유 돈수.
일산 정각사 소장 『다암서첩(茶菴書帖)』에 실린 1850년 3월 24일자 편지다.
『다암서첩』은 호의와 각안 두 스님을 수신인으로 유산 형제와 그 아들 및 조면호, 신관호 등이 보낸 편지를 묶은 것이다.
앞서 본 『유산일문첩』보다 뒷 시기의 편지가 대부분이다.
36년 전 아버지 다산을 뵙기 위해 강진으로 내려왔다가 놀러갔던 대둔사의 만일암과 북암 등의 아름다운 광경을 떠올렸다.
옥초산(沃焦山)은 동해 바다 어딘 가에 있다는 전설 속의 산이름이다. 호의의 차가 이 선계의 감로수와 같다고 말했다.
이리 귀한 수제진품차를 끊이지 않고 마실 수 있었던 것이 호의와 초의 두 스님의 두터운 정 때문이었다고 감사를 표시했다.
이상 정학연·정학유 형제가 호의 스님께 보낸 차 편지를 차례로 읽어 보았다.
그간 초의와 추사 사이에 오간 차 편지는 널리 알려진 데 반해, 정학연 형제의 차 편지는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이들 편지를 통해 새롭게 밝혀진 사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둔사에서 호의가 만들어 서울로 보낸 차에 대해 장춘차(長春茶)·두륜진차(頭輪眞茶)·두륜진품(頭輪眞品)·
두강차(頭綱茶)·수제가명(手製佳茗)·수제진품(手製珍品)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부른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그간 초의만 차를 만들어 서울로 보낸 것으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호의의 두륜진차가 초의차 못지 않은 명성을 지녔음을 구체적 자료에 근거하여 처음으로 밝혔다.
셋째, 초의와 호의, 그리고 안익 등 대둔사의 여러 승려들이 각자 따로 차를 만들어 제각금 보냈으리만치
대둔사 승려들의 차 생산량은 일반적 예상을 넘어서는 상당한 분량이었음을 알았다.
넷째, 차는 이들에게 주로 체증을 내려주고 기침을 가라앉혀주는 약용으로 애용되었고,
이들은 답례로 글씨와 차호(茶壺) 등을 보내며 서로 마음을 나누었다.
다섯째, 해남에서 올라온 차는 시기가 확인된 것만도 1831년부터 1850년까지 20년에 이르는 세월에 걸쳐 있다.
여섯째, 정학유의 언급을 통해 볼 때, 이들이 1년에 마신 차의 양이 수 십 근이 넘을 만큼
상당한 규모로 차 생활을 영위했던 차인임을 알게 되었다.
호의의 암자가 있던 두륜산의 정상 부근.
염제 신농씨의 모습
이규경의 「도차변증설荼茶辯證說 」고
이규경(李圭景), 1788~1856)은『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에
「도차변증설(荼茶辯證說)」과 「종차의이청양변증설(種茶薏苡靑辨證說)」,
「전과다탕변증설(煎果茶湯辨證說)」등 차와 관련된 여러 글을 남겼다.
백과전서적 지식 경영이 유행하던 당시 학풍의 영향을 받아, 수많은 차 관련 전적을 섭렵하고
일일이 전거를 찾아 소종래를 밝혔다. 이 글에서는 이규경의
「도차변증설」을 중심으로 그의 차 관련 논의를 살펴보겠다.
이 글은 '도(荼)' 자와 차(茶)' 자의 관계, 중국 역대 명차에 대한 정리,
우리 차의 역사에서 차 재배법과 끓이는 법에 이르기까지다양한 주제를 포함하고 있다.
작자 미상. 「상산사호도(商山四皓圖)」 개인 소장.
명 구영(仇英) 「송계논화(松溪論畵)」 대만 국립고궁박물원 소장.
명차와 차 끓이는 도구 및 방법에 관한 논의를 모았다.
우리나라 차의 내력을소개하는 한편, 중국 역대의 각다 정책을 설명했다.
차 씨앗을 심어 가꾸는 방법을 알려주고,
일본 사람의 기록까지 꼼꼼히 살펴 친절하게 설명했다.
또 차를 함께 넣은 다탕과 그 밖의 여러 대용 음료에 대해서도 소개하였다.
그는 수 십종의 중국 다서를 섭렵하여 이들 내용을 간추